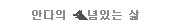지난 주엔 진행 중인 작업도 정리하고 스트레스도 풀겸 홀로 캠핑을 다녀왔다.
머물다 온 곳은 Little Pond 라는 호수를 중심으로 들어선 리틀폰드 캠핑장으로, 뉴욕의 대표적 산악지역인
Catskill에 위치해있으며 맨하튼에서는 북서쪽으로 차를 달려 2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게된다.
되도록 조용한 곳을 원했기때문에 좀 더 동쪽에 있는 Devil's Tombstone 캠핑장을 점찍어 두었지만
그곳이 올 한해 동안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캣츠킬 지역의 8개 국립 캠핑장 중 그나마 비교적 캠프 사이트 수가
적은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환경이나 경관,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하다.
단 한가지 불편한게 있다면, 이곳은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
캠핑 사이트에서 안테나 시그널이 잡히지 않길래 공원 직원에게 물으니 9마일(14Km)이나 나가야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도시 촌놈이라 놀리는 말인줄 알았는데, 정말 차를 몰고 9마일을 나가야 통화가 되었다. OMG!


리틀폰드는 사방이 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호수로, 산을 타고 내려온 빗물과 지하수로 형태가 유지된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다 본 위 사진과 같이 그 모양새가 하트 모양이라 신기하다.
이거 Little Heart Pond라고 불러도 좋을거 같은데.

지리적으로 설리반 카운티에 속한 리틀폰드는 캠프장 인근에 상점이나 편의점같은 시설이 없다.
그래서 13마일 정도 거리의 Livingston Manor라는 마을에서 미리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해 들어오는 게 낫다.
이 마을 초입에서 Peck's Market이라는 상점을 찾을 수 있는데 시골 마을 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에 빵집까지
갖춘 곳으로,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보니 나를 제외한 모두가 계산대 앞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서로의 근황을 묻곤한다.


그렇게 다시 차를 몰아 Beaverkill 로드를 달리는데 느닷없이 비포장 도로가 눈 앞에 펼쳐진다.
미국에 온 이후로 지도에 표시된 도로 중 포장이 안된 도로를 달린 게 처음이라 무척 생소하다.

비포장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리틀폰드 캠프그라운드'의 입간판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전날 전화를 통해 직접 가서 둘러본 후 캠핑할 사이트를 정하면 안되겠냐고 요청했던 터라
차를 가지고 모든 사이트를 전부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51번 사이트를 내가 묶을 장소로 선정했다.
이곳의 비용은 1박에 $22이며 불을 지필 수 있는 장작은 $7에 판매하고있다.

막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을 지으려 주섬주섬 캠핑용품들을 피크닉 테이블 위에 꺼내고 있는데
바로 옆 죽은 고목 위에 딱다구리 Woodpecker 한 마리가 날아와 연신 나무를 쪼으며 벌레를 잡아먹고 있다.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던터라 하던 일을 멈추고 내내 딱다구리 삼매경에 빠졌버렸다.
만화에서 보면 높다란 빨강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짐작컨데 이렇게 민머리인 것은 암컷인듯 싶다.

이번 캠핑에서 딱다구리 말고도 호반새와 벌새도 두 눈으로 직접 봤다.
호반새는 트래킹 도중 발견한 저수지의 바위 위에 앉아있었는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듯 보였다.
헌데 얼마나 경계심이 강한지 내가 몸을 다 드러내기도 전에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Ruddy Kingfisher라는 이름처럼 붉은 색이 화려하게 도드라져 보이던 호반새였다.
벌새는 이틀째 되던 날 저녁식사 중에 내 캠프 사이트 나무들을 옮겨다니고 있었는데
그 작은 사이즈 때문에 처음에는 나방이나 큰 곤충으로 착각을 하다가 나무 위에 앉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게 벌새임을 알게 되었다. 제 자리에서 비행을 할 때는 조금의 미동도 없는 것이 날때는 전광석화와 같았다.
중남미 대륙에 주로 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북미까지 올라와 사는지 미처 몰랐다. 미친 것인가..

아직 무더운 여름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산 속의 밤은 제법 쌀쌀한 편이었다.
달랑 침낭 두 개만 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추위에 몇 번이나 깼던 것 같다.
추위말고도 또 다시 나를 깨운 것은 인근을 지나던 늑대 떼였는데, 그 고요한 밤에 어찌나 소름끼치게 울던지
언제라도 내 텐트를 덮칠 것만 같은 공포감에 깊은 잠을 못 이루고 겨우겨우 아침을 맞이했다.
어릴적 시골집에 놀러 갔다가 들어 본 이후 처음인데 안 들어본 사람은 그 공포감을 모른다.
아침식사로 펙스 마켓에서 구입한 빵과 우유를 먹고 캠프장 산책을 나섰는데
이곳 야영객 대부분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었고 그나마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왼쪽 끝에 호수를 따라 자리한 곳들이 이곳의 명당격인 68번부터 75번 사이트인데
이 명당에 머물기 위해서는 차를 먼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짐을 가지러 다녀야하니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





작은 비치도 마련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들어가기엔 대단히 쑥스러울만큼 얕기때문에 아이들만 놀게 된다.
물론 아무리 깊지 않더라도 라이프 가드가 있는 시간에만 수영이 허락된다.



저녁 무렵, 천둥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더니 샤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퍼붓는 비에 오도가도 못한채 바베큐 에어리어에 묶여있기를 이 십 여분,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날씨는 금새 청명하게 변해버렸다.
덕분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산안개 혹은 산김을 실컷 구경했다.


다음 날은 이곳 캠핑장과 연결된 트레일을 따라 트래킹을 해보기로 했다.
이곳에서 접근 가능한 두 개의 트레일 중, 2.9마일 길이의 Touch-Me-Not 트레일이 오늘의 목표 행선지로
리틀폰드 캠핑장 주위를 크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헌데 트레일 초입에 왠 붉은 함이 하나 서있고 그곳에 Please Register라는 문구가 박혀있다.
말이 Please지 이런 색상 조합이면 이건 청유형이 아니라 완전 경고형으로 다가온다.

대체 뭐가 들었나 열어보았더니 트레일을 나섰던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출발일을 적는 기록지가 놓여있다.
얼마나 다니는 사람이 없는지 지난 5일간 6팀만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나마 오늘 출발한 사람 둘은 출발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Check Out 란에 표시가 되질 않았다.

이쯤에서 덜컥 겁이 났다.
미국 캠프장에서야 늘 듣는 주의사항이지만 나는 단 한번도 곰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와 본적이 없던 것 같다.
특히 나처럼 산 속에 혼자 들어간다면 곰은 귀신x귀신x귀신x귀신 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것이다.
이런 곰에 대한 공포는 전적으로 빌 브라이슨 아저씨가 쓴 '나를 부르는 숲'이란 책때문이다.
미국 동부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애팔레치아 산맥 트레일에 관한 여행서인데 어찌나 겁을 주던지 말이다.
실제 내가 곰을 맞닥뜨린 건 단 한번이다. 다행히 나는 자동차 안에 있었고 곰은 자동차 밖에 있었다.
또 한번은 캐나다의 한 캠핑장에서 한 밤 중에 사람들이 냄비를 두들기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다음 날 아침, 어제 밤에 나타난 곰을 쫓으려 사람들이 그 난리를 부렸다는 얘길 듣게 되었다. ㅎㄷㄷ
암튼, 곰은 곰이고 나는 트래킹을 해야하겠기에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본격적으로 길을 나섰다.




출발한지 십분도 안돼 자칫 곰 때문에 산행을 포기할 뻔 했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예상 외로 산길이 무척이나 버라이어티했기 때문이다. 오르막이 계속되는 초입을 지나니 빽빽한 소나무 숲이
나왔고, 그곳에서 좀 더 오르니 하늘 높이 솟은 메타세콰이어 숲이 시원스럽게 길을 내어주고 있었다.

경계심 더럽게 강한 호반새가 머물던 산 중 저수지



또 다시 오솔길을 지나 몇 번의 언덕을 오르고 내리니 느닷없이 확 트인 들판이 펼쳐진다.
산 중턱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넓은 지대에 야생화들이 가득 들어찬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저 소나무 숲에서 마리아가 일곱 명의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뛰쳐나와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그런.



하지만 어울리기로 치면 곰역시 마리아에 뒤지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또 다시 불안해졌다.
혹여 이 들판에서 꿀통이라도 발견한 곰이 내가 그것을 뺏을거라고 생각하지나 않을까?
에스키모인들은 북극곰이 덮칠 때 용기를 내어 곰의 코를 있는 힘껏 주먹으로 쳐서 위기를 모면한다던데
나도 그러면 될까? 혹시 북극곰만 아파하는 거면 어쩌지..
정말 한심하게도 산행 내내 한 생각의 70% 이상이 곰 생각이었던 것 같다.
물론 남은 여정 동안 다행히 곰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곰 일은 모르는 법이다.
어디에 숨어 내가 방심하기를 기다렸을지도..

암튼, 산행을 끝으로 나의 짧은 혼자만의 캠핑도 끝이 났다.
올 가을엔 단풍구경 삼아 바베큐도 해 먹을겸 피크닉으로 하루 다녀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머물다 온 곳은 Little Pond 라는 호수를 중심으로 들어선 리틀폰드 캠핑장으로, 뉴욕의 대표적 산악지역인
Catskill에 위치해있으며 맨하튼에서는 북서쪽으로 차를 달려 2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게된다.
되도록 조용한 곳을 원했기때문에 좀 더 동쪽에 있는 Devil's Tombstone 캠핑장을 점찍어 두었지만
그곳이 올 한해 동안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캣츠킬 지역의 8개 국립 캠핑장 중 그나마 비교적 캠프 사이트 수가
적은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환경이나 경관,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하다.
단 한가지 불편한게 있다면, 이곳은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
캠핑 사이트에서 안테나 시그널이 잡히지 않길래 공원 직원에게 물으니 9마일(14Km)이나 나가야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도시 촌놈이라 놀리는 말인줄 알았는데, 정말 차를 몰고 9마일을 나가야 통화가 되었다. OMG!


리틀폰드는 사방이 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호수로, 산을 타고 내려온 빗물과 지하수로 형태가 유지된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다 본 위 사진과 같이 그 모양새가 하트 모양이라 신기하다.
이거 Little Heart Pond라고 불러도 좋을거 같은데.

지리적으로 설리반 카운티에 속한 리틀폰드는 캠프장 인근에 상점이나 편의점같은 시설이 없다.
그래서 13마일 정도 거리의 Livingston Manor라는 마을에서 미리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해 들어오는 게 낫다.
이 마을 초입에서 Peck's Market이라는 상점을 찾을 수 있는데 시골 마을 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에 빵집까지
갖춘 곳으로,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보니 나를 제외한 모두가 계산대 앞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서로의 근황을 묻곤한다.


그렇게 다시 차를 몰아 Beaverkill 로드를 달리는데 느닷없이 비포장 도로가 눈 앞에 펼쳐진다.
미국에 온 이후로 지도에 표시된 도로 중 포장이 안된 도로를 달린 게 처음이라 무척 생소하다.

비포장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리틀폰드 캠프그라운드'의 입간판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전날 전화를 통해 직접 가서 둘러본 후 캠핑할 사이트를 정하면 안되겠냐고 요청했던 터라
차를 가지고 모든 사이트를 전부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51번 사이트를 내가 묶을 장소로 선정했다.
이곳의 비용은 1박에 $22이며 불을 지필 수 있는 장작은 $7에 판매하고있다.

막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을 지으려 주섬주섬 캠핑용품들을 피크닉 테이블 위에 꺼내고 있는데
바로 옆 죽은 고목 위에 딱다구리 Woodpecker 한 마리가 날아와 연신 나무를 쪼으며 벌레를 잡아먹고 있다.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던터라 하던 일을 멈추고 내내 딱다구리 삼매경에 빠졌버렸다.
만화에서 보면 높다란 빨강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짐작컨데 이렇게 민머리인 것은 암컷인듯 싶다.

이번 캠핑에서 딱다구리 말고도 호반새와 벌새도 두 눈으로 직접 봤다.
호반새는 트래킹 도중 발견한 저수지의 바위 위에 앉아있었는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듯 보였다.
헌데 얼마나 경계심이 강한지 내가 몸을 다 드러내기도 전에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Ruddy Kingfisher라는 이름처럼 붉은 색이 화려하게 도드라져 보이던 호반새였다.
벌새는 이틀째 되던 날 저녁식사 중에 내 캠프 사이트 나무들을 옮겨다니고 있었는데
그 작은 사이즈 때문에 처음에는 나방이나 큰 곤충으로 착각을 하다가 나무 위에 앉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게 벌새임을 알게 되었다. 제 자리에서 비행을 할 때는 조금의 미동도 없는 것이 날때는 전광석화와 같았다.
중남미 대륙에 주로 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북미까지 올라와 사는지 미처 몰랐다. 미친 것인가..

아직 무더운 여름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산 속의 밤은 제법 쌀쌀한 편이었다.
달랑 침낭 두 개만 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추위에 몇 번이나 깼던 것 같다.
추위말고도 또 다시 나를 깨운 것은 인근을 지나던 늑대 떼였는데, 그 고요한 밤에 어찌나 소름끼치게 울던지
언제라도 내 텐트를 덮칠 것만 같은 공포감에 깊은 잠을 못 이루고 겨우겨우 아침을 맞이했다.
어릴적 시골집에 놀러 갔다가 들어 본 이후 처음인데 안 들어본 사람은 그 공포감을 모른다.
아침식사로 펙스 마켓에서 구입한 빵과 우유를 먹고 캠프장 산책을 나섰는데
이곳 야영객 대부분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었고 그나마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왼쪽 끝에 호수를 따라 자리한 곳들이 이곳의 명당격인 68번부터 75번 사이트인데
이 명당에 머물기 위해서는 차를 먼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짐을 가지러 다녀야하니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





작은 비치도 마련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들어가기엔 대단히 쑥스러울만큼 얕기때문에 아이들만 놀게 된다.
물론 아무리 깊지 않더라도 라이프 가드가 있는 시간에만 수영이 허락된다.



저녁 무렵, 천둥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더니 샤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퍼붓는 비에 오도가도 못한채 바베큐 에어리어에 묶여있기를 이 십 여분,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날씨는 금새 청명하게 변해버렸다.
덕분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산안개 혹은 산김을 실컷 구경했다.


다음 날은 이곳 캠핑장과 연결된 트레일을 따라 트래킹을 해보기로 했다.
이곳에서 접근 가능한 두 개의 트레일 중, 2.9마일 길이의 Touch-Me-Not 트레일이 오늘의 목표 행선지로
리틀폰드 캠핑장 주위를 크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헌데 트레일 초입에 왠 붉은 함이 하나 서있고 그곳에 Please Register라는 문구가 박혀있다.
말이 Please지 이런 색상 조합이면 이건 청유형이 아니라 완전 경고형으로 다가온다.

대체 뭐가 들었나 열어보았더니 트레일을 나섰던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출발일을 적는 기록지가 놓여있다.
얼마나 다니는 사람이 없는지 지난 5일간 6팀만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나마 오늘 출발한 사람 둘은 출발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Check Out 란에 표시가 되질 않았다.

이쯤에서 덜컥 겁이 났다.
미국 캠프장에서야 늘 듣는 주의사항이지만 나는 단 한번도 곰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와 본적이 없던 것 같다.
특히 나처럼 산 속에 혼자 들어간다면 곰은 귀신x귀신x귀신x귀신 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것이다.
이런 곰에 대한 공포는 전적으로 빌 브라이슨 아저씨가 쓴 '나를 부르는 숲'이란 책때문이다.
미국 동부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애팔레치아 산맥 트레일에 관한 여행서인데 어찌나 겁을 주던지 말이다.
실제 내가 곰을 맞닥뜨린 건 단 한번이다. 다행히 나는 자동차 안에 있었고 곰은 자동차 밖에 있었다.
또 한번은 캐나다의 한 캠핑장에서 한 밤 중에 사람들이 냄비를 두들기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다음 날 아침, 어제 밤에 나타난 곰을 쫓으려 사람들이 그 난리를 부렸다는 얘길 듣게 되었다. ㅎㄷㄷ
암튼, 곰은 곰이고 나는 트래킹을 해야하겠기에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본격적으로 길을 나섰다.




출발한지 십분도 안돼 자칫 곰 때문에 산행을 포기할 뻔 했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예상 외로 산길이 무척이나 버라이어티했기 때문이다. 오르막이 계속되는 초입을 지나니 빽빽한 소나무 숲이
나왔고, 그곳에서 좀 더 오르니 하늘 높이 솟은 메타세콰이어 숲이 시원스럽게 길을 내어주고 있었다.

경계심 더럽게 강한 호반새가 머물던 산 중 저수지



또 다시 오솔길을 지나 몇 번의 언덕을 오르고 내리니 느닷없이 확 트인 들판이 펼쳐진다.
산 중턱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넓은 지대에 야생화들이 가득 들어찬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저 소나무 숲에서 마리아가 일곱 명의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뛰쳐나와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그런.



하지만 어울리기로 치면 곰역시 마리아에 뒤지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또 다시 불안해졌다.
혹여 이 들판에서 꿀통이라도 발견한 곰이 내가 그것을 뺏을거라고 생각하지나 않을까?
에스키모인들은 북극곰이 덮칠 때 용기를 내어 곰의 코를 있는 힘껏 주먹으로 쳐서 위기를 모면한다던데
나도 그러면 될까? 혹시 북극곰만 아파하는 거면 어쩌지..
정말 한심하게도 산행 내내 한 생각의 70% 이상이 곰 생각이었던 것 같다.
물론 남은 여정 동안 다행히 곰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곰 일은 모르는 법이다.
어디에 숨어 내가 방심하기를 기다렸을지도..

암튼, 산행을 끝으로 나의 짧은 혼자만의 캠핑도 끝이 났다.
올 가을엔 단풍구경 삼아 바베큐도 해 먹을겸 피크닉으로 하루 다녀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