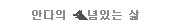연일 이어지던 비가 그치니 날씨가 금새 가을을 닮아간다.
주말을 맞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그릴과 바베큐 재료를 싸들고 Inwood Hill 공원에 다녀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인근 Fort Tryon 공원에 들러 산책 겸 데이트 겸 아내와 모처럼 시간을 보냈다.

포트 트라이언 공원은 Fort라는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요새로 쓰였던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맨하튼 맨 북쪽의 폭이 좁은 인우드 지역에 위치해있으며 할램의 바로 윗 동네인 셈이다.
아무래도 요새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이 공원에 올라 서쪽을 보면 허드슨 강 위로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George Washington Bridge를 볼 수 있다.

뉴욕을 가르는 허드슨 강 주변으로 여러 요새들이 들어선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대개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해군의 침입에 대비해 지어진 것들로, 아래 사진 하단에 보이는 난간 역시
새롭게 복원된 옛 요새의 전망대 부분이다.

포트 트라이언 공원은 애초 생각했던 것 보다 꽤 넓은 지역에 여러 산책길들이 울창한 숲 사이에 자리했으며
공원 곳곳에 Quiet 이라는 푯말이 붙어있었는데 그래선지 자동차 소리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차분한 느낌이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센트럴 파크와 비교하니 이건 마치 수도원에라도 들어선 듯 하다.

참고로, 공원을 설계한 Frederick Law Olmsted Jr.는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Frederick Law Olmsted의 아들로
1935년에 포트 트라이언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대부호 록펠러다.
록펠러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이어 하기로 하고..

공원을 들어서면 초입 왼편에 잘 가꾸어진 계단식 가든이 보이는데, Heather Garden이라는 이름의 이 정원은
공원 설계 단계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있는 공원의 터줏대감으로 다양한 식물군과 예쁜 꽃들을 감상할 수 있다.
여자 이름으로도 붙여지는 헤더 Heather 라는 명칭은 야생화의 한 종류로 아래 사진 하단에 보이는 흰색 꽃이다.
멀리서 보면 오른편에 보이는 허브처럼 줄기 식물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 흰 부분이 모두 별사탕처럼
작고 동글한 꽃들로 송이를 이루는 모습이다.


헤더 정원의 주인공 Heather

수령초의 한 종류인 Cape Fuchsia

가느다란 실이 뭉쳐진 모양의 Floss Flower

일본 자생의 아네모네, Japanese Anemone

오랜동안 꽃의 색이 변하지 않는 Globe Amaranth, 말려서 장식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대천사장이라는 뜻의 Archangel, 우리나라에서는 참당귀라 불리며 보통 약재로 쓰인다.

꽃잔디 혹은 지면패랭이꽃이라 불리는 Phlox

내겐, 영화 '블랙 달리아'로 기억되는 Dahlia

말린 쥐포 크기의 이 식물은 그 잎이 온통 부드러운 털로 뒤덮여 있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꽃은 태어나 처음 본 것인데 여러 잎들이 정확히 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크기가 엄청나서 왠만한 아이들 얼굴보다도 더 큰 듯 보였다.
이 외에도 식물원에나 가야 볼 법한 여러 품종의 꽃과 식물들을 비롯해 라벤더, 라임 그리고 각종 허브들이
지천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니, 한 일주일만 내 정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뜯어먹게.

가든에서 이어지는 길목은 예전에 만든 요새의 성벽들을 따라 걷게 되어 있었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그 돌을 연마해 둔 솜씨가 마치 칼로 두부를 잘라 올린듯 반듯하며 빈틈이 없다.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암석에서 한창 연습에 매진 중인 암벽등반가 아저씨

포트 트라이언 공원에는 이곳을 대표하는 두 개의 건물이 있다.
그 하나는 현재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New Leaf 라는 상호의 건물로, 원래 Frederick L. Olmsted Jr.가
공원을 설계할 당시 사무실과 까페테리어의 용도로 쓰기 위해 지은 것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황폐화
된 이곳을 1995년, 영화배우인 배트 미들러 아주머니가 지인들과 뜻을 뭉쳐 이곳을 식당으로 재건시킨 것이다.
이 레스토랑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재단을 만들었으며, 레스토랑의 수익의 많은 부분을 다시금 기부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재료로 만드는 멋진 식사를 숲에 둘러싸여 먹는 낭만적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www.newleafrestaurant.com
이은 또 하나의 대표적 건물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분관이라 불리는 The Cloisters Museum 이다.
수도원이라는 이름의 클로이스터 뮤지엄은 중세시대의 역사적 자료들만을 보관, 전시하는 중세유물 박물관으로,
맨하튼 81가에 자리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직접 운영하는 부속 박물관인 셈이다.
아래 사진에 등장하는 건물이 이 박물관의 남쪽 모습이다.

이 박물관을 가득채운 대부분의 유물들은 원래 조각가이자 중세유물 수집가인 George G. Barnard의 소유물로
이것을 대부호 록펠러가 모두 사들인 후, 포트 트라이언 공원 북부의 토지를 구입, 그 대지에 지금의 박물관을
짓고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수집품들과 함께 모든 것을 뉴욕 시에 기부했고, 이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흠.. MoMA의 작품들부터 링컨센터까지 록펠러 가문은 뉴욕을 완전히 소유한 듯 보인다.
박물관이 담고 있는 유물들의 성격을 반영하려는 의도인지 이 건물은 중세시대의 종교건축적인 요소를 차용해
설계되었는데 그래서인지 박물관 내부에 들어가보면 마치 유서깊은 수도원에 온듯한 착각이 든다.
클로이스터 뮤지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건물 내부 뿐 아니라 주변 도로 역시, 틀에 찍어내거나 구워낸 벽돌이 아닌 일일히 깍은 돌을 빼곡히 박아 넣어
나선형 도로로 바닥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진정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듯 하다.

동쪽에서 올려다 본 박물관의 모습인데,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나 나올 법한 수도원의 아우라가 느껴진다.

위치가 맨하튼인 만큼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
위 사진의 M4 버스 정류장이 박물관 입구를 마주보고 있으며, 지하철로는 A라인 Dyckman Street가 가깝고
이전 정거장인 190th Street에 내리면 포트 트라이언 공원의 입구부터 걸어서 들어올 수 있다.

Linden Terrace에 설치된 대형 성조기

Linden Terrace에서 바라본 브롱스 전경

Cloisters Lawn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원한 허드슨 강과 강 건너 뉴저지

Linden Terrace 밑을 관통하는 아치형 터널



선선한 가을 날, 담요 한 장에 가볍게 샌드위치 하나 사들고 데이트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듯 하다.
적어도 도시의 번잡스러움과 소음을 피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