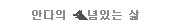대개 미국의 대 도시는 그곳을 대표하는 지역 방송사를 가지고 있다.
NBC나 CBS, ABC처럼 미 전역을 커버하는 대형 방송사들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 편성량이 적은 지역 방송사의 뉴스는 바쁘게 출근을 준비하는 뉴요커들에겐 좋은 정보원이 되곤 한다.
그 중 뉴욕을 대표하는 지역방송이 바로 NY1이라는 채널이다.
오늘 아침, NY1 채널에서 뜬금없이 서울에 관한 뉴스가 방송되었다.
첫 머리에 '한국전쟁 60주년'이란 멘트가 나오길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것인듯 싶어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뒤 이어 흘러나오는 서울의 지하철에 관한 인터뷰에서 그만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다.
아래 동영상이 오늘 방영된 NY1의 방송 내용이다.
(버퍼링이 심하면 -> NY1 채널 뉴스 바로보기)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도심을 담은 영상 위로, 뉴욕 하원의원이자 한국전 참전용사인 Charles Rangel의 인터뷰가
나오고, 뒤이어 전자제품, 자동차, 세계 2위의 선박수주 등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언급된다.
이어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문제를 거론하며 자연스럽게 서울의 지하철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는데,
첨단 스크린 도어까지 갖춘 전자동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 운임료가 뉴욕 지하철의 요금의 반값도 안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데다 더우기 깨끗하기까지 하다는 것에 다소 강한 인상을 받은 듯 하다.
헌데 서울의 한 시민과의 인터뷰에서 질문하던 리포터의 한국말이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리포터 : 서울 지하철, 좋아? 안좋아? (Are subway systems in seoul good?)
설시민 : 아.. 좋은대요.(-_-;;)
리포터 : 왜? (Why?)
설시민 : 일단 넓구요, 편하고, 쾌적하고..(어, 말이 짧네)
리포터 : 깨끗해? (Is it clean?)
설시민 : 네, 깨끗해요.(이거 뭥미..)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질문들이 죄다 반말이다 보니 시민의 첫 반응이 약간 뻥찌는 표정인데다,
앞 뒤 다 잘라먹은 것이 마치 시비를 걸거나 협박하는 어투로 들리는지라 대략 난감했을듯..
물론, 이 동영상을 본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 통역도 못구하나?', '차라리 영어로 하지'라고 생각할테지만
사실 리포터인 Lewis Dodley씨는 나름 한국문화에 친숙한 편으로, 그의 아내가 한국사람이다.
아마 본인이 조금 한국말을 한다고 생각해 인터뷰를 한 것같은데 아무래도 집에서 아내에게 반말을 배운듯 싶다.
또한 Lewis Dodley는 벌써 18년간이나 NY1의 메인앵커를 맡고있는 베테랑으로, 몇 달 전인가 가수 '보아'가
미국 진출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도 NY1 채널을 통해 직접 '보아'와 인터뷰를 나눴다.
암튼, 처가 방문 차원에서 한국을 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Dodley씨가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서울 지하철 리포트는 뉴욕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
뉴욕 지하철은 그 역사가 100년이 넘은 '골동철'로, 버스와 함께 MTA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않다.
최근 미국 경기의 악화로 인한 여파로 직원감축과 지하철과 버스 라인의 축소, 부분 폐지라는 강도높은 체중감량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피해갈 수 없자, 급기야 또 다시 운행요금 인상이라는 뻘짓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임금인상과 자꾸만 불어나는 시설 관리비용과 새구간 건설비용때문에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는 마당에, 최근 MTA 직원들에게 휴가 중에도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뉴요커들의 뉴욕 지하철에 대한 시선은 경멸 그 이상이다.
커다란 쥐들과 악취내음, 쓰레기 그리고 치안이 이뤄지지 않는 위험성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우물 안 개구리 마냥 자기네가 최고라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 이번 서울 지하철이 작은 경종이 되지 않았을까.
참고로, 현재 뉴욕 지하철의 1개월 정액권 가격이 $89(10만5천원)이며, 새 인상방안은 $104(12만3천원)이다.
더불어 지하철 표를 구매할 때 별도로 $1의 표값(충전가능)도 받는 방안도 나왔다고 하니
뉴욕 관광을 앞둔 사람이면 결코 머나먼 남 얘기만은 아닌 것이다. 댕잇!
'뉴스골라보기'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10.07.29 서울 지하철, 좋아? 안좋아? 2
- 2010.03.24 일본 개요
- 2009.11.20 굿바이, 장 끌로드! 2
- 2009.11.10 한국 입양아들과 그들의 정체성 1
- 2009.08.21 찢겨진 센트럴파크
- 2009.08.19 도심의 트럭텃밭
- 2009.06.24 집주인 위에 세입자
- 2009.06.23 귀여운 고양이 이론
- 2009.06.19 뉴욕 햄버거 평가단 2
- 2009.06.09 천공의 공원, High Line
- 2009.06.06 메시와의 재회
- 2009.05.28 거짓된 이미지의 유혹
- 2009.05.27 아프리카의 보물, 바오밥 나무
- 2009.05.26 동성결혼의 경제적 관점
- 2009.03.28 뉴욕 지하철 요금인상
복잡하고 어려운 수치나 조사를 통한 통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픽화 시키는 작업인데,
정보의 전달에 한계를 지닌 지면을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플래시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상을 통해
역사나 문화같이 보다 심층적인 내용들 마저도 간략하게 전달하면서도 지루함을 더는 위트도 빼놓지 않는다.
아래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일본에 관한 이야기인데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만큼이나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오늘, 환경예술가인 Jeanne Claude 여사께서 74세의 일기로 뉴욕 맨하튼에서 세상을 떠났다.
Environmental Artist 라는 단어를 번역하자니 환경예술가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장 끌로드는 특정한 공간이나 구조물을 천이나 종이 등의 소재로 감싸거나 펼쳐내어 장엄한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작품들을 주로 만들어내는 작가로, 무엇보다 그 스케일에 있어 광활한 대지나 큰 건물을 이용한 작업을 해왔기에
여타 갤러리에서 만나는 작품들과 달리 보는 이를 시각적으로 압도하면서도 진기한 흥미로움을 동시에 주었다.
몇 년 전, 뉴욕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이들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이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트라이베카를 찾아 이 영화도 보고 이후 마련된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서 장 끌로드와 그녀의 남편이자
공동 작업자인 Christo Javachef 를 눈 앞에서 보는 기회를 가졌었다.
아래 사진이 그때 찍은 것으로, 왼편에서 두번째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사람이 크리스토, 그리고 옆이 장 끌로드다.
바로 옆에 마이크를 든 사람은 그들의 다큐멘터리 필름 'The Gates'의 감독인 Albert Maysle이고.

장 끌로드는 1935년 모로코에서 출생한 프랑스인으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자라났고 독특하게도 튀니지 대학에서
라틴어와 철학을 공부했다. 그런 그녀가 1958년 프랑스 파리에서 불가리아 망명자 신분의 예술가 크리스토를
만나게 되는데, 이미 이 무렵 크리스토는 작은 사물들을 천으로 감싸는 형식의 작품들을 하고 있었는데 장 끌로드가
공동작업자로 합류하면서 실내 및 실외의 거대한 오브젝트나 환경을 감싸는 대규모 형태의 작업 스타일을 이루어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3년간 공동작업을 하던 그들은 1994년부터 Christo and Jeanne-Claude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유명세를 떨치기 훨씬 이전인 1964년, 장 끌로드와 크리스토 부부는 작품활동을 위해 뉴욕으로 이주를 하는데
정작 주거지인 뉴욕에서는 이렇다할 작품을 내 놓지 못하고 오랜 세월 대부분 해외에서 작업을 해야만했다.
그 배경에는 대형 설치미술을 허가하지 않는 뉴욕의 깐깐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그들의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초반에 등장하는 장 끌로드와 크리스토 부부는 지금과 달리 무척이나 젊은 1979년의 모습들이다.
자신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The Gates를 맨하튼의 센트럴 파크에 설치하기 위해 뉴욕시의 관료들을 찾아가
작업을 위한 스케치와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하는데 정작 관료들의 반응은 '작업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거냐?',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없다.', '진짜 의도는 다른게 아니냐'며 다분히 행정적으로 이들을 대한다.
뉴욕시를 설득하는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각 지역의 시민대표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미팅들이
이어진다. 작품을 위한 모든 비용을 장 끌로드와 크리스토 본인들이 마련할 것을 역설해도 그 허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2005년 이들의 작품 The Gates가 센트럴 파크에서 선보였으니 한 작품을 위해 이들이 기다린 시간만
26년이 걸린 셈이다. 영화를 보는 모든 뉴욕 관객들조차 상영내내 어이없는 헛웃음을 곳곳에서 내곤했던 기억이 난다.
마침내 2주간에 걸쳐 전시된 작품 The Gates는 뉴욕 시민들에게 큰 매력을 선사했고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 또한
작품 사이를 걸으며 이를 배경으로 멋진 추억을 가져갔다. The Gates로 인한 뉴욕의 관광수입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The Gates
Central Park, New York City, 1979-2005
영화 상영이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차기 작품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장 끌로드는 웃음을 머금은 채, 콜로라도에 있는 알라스카 강을 천으로 뒤덮는 Over the Rive라는 이름의 작품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째 콜로라도 시 관료들과 지역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 언제 허가가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어린 답을 돌려주었다.
지금의 위치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환영을 받을 법도 한데, 꼼꼼하게 환경이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미국의
풍토가 존경스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답답함 또한 느껴진다. 예술은 진정 어려운 것인가 보다.
결국 콜로라도 프로젝트와 더불어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예정되어 있던 41만개의 기름통을 동원한 거대한 무덤
프로젝트의 완성을 보지 못한채 장 끌로드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의 남편인 크리스토가 예의
Christo and Jeanne-Claude의 이름으로 다시금 관객들을 찾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굿바이, 장 끌로드!

WRAPPED TREES
Fondation Beyeler and Berower Park
Riehen, Switzerland, 1997-98

Wrapped Reichstag
Berlin, 1971-95

The Umbrellas
Japan, 1984-91

The Pont Neuf Wrapped
Paris, 1975-85

Surrounded Islands
Miami, Florida, 1980-83

Running Fence
Sonoma and Marin Counties, California, 1972-76
Jeanne-Claude, Collaborator With Christo on a Grand Canvas, Dies at 74
November 19, 2009
by WILLIAM GRIMES
Jeanne-Claude, who collaborated with her husband, Christo, on dozens of environmental arts projects, notably the wrapping of the Pont Neuf in Paris and the Reichstag in Berlin and the installation of 7,503 vinyl gates with saffron-colored nylon panels in Central Park, died Thursday in Manhattan, where she lived. She was 74.
The cause was complications of a brain aneurysm, her family told The Associated Press.
Jeanne-Claude met her husband, Christo Javacheff, in Paris in 1958. At the time, Christo, a Bulgarian refugee, was already wrapping small objects. Three years later, they collaborated on their first work, a temporary installation on the docks in Cologne, Germany, that consisted of oil drums and rolls of industrial paper wrapped in tarpaulin.
To avoid confusing dealers and the public, and to establish an artistic brand, they used only Christo’s name. In 1994 they retroactively applied the joint name “Christo and Jeanne-Claude” to all outdoor works and large-scale temporary indoor installations. Other indoor work was credited to Christo alone.
Their working methods, as described on their Web site, remained constant throughout the years. After jointly conceiving of a project, Christo made drawings, scale models and other preparatory works whose sale financed the project. Working with paid assistants, they did the on-site work: wrapping buildings, trees, walls or bridges; erecting umbrellas (“The Umbrellas,” 1991); spreading pink fabric around islands in Biscayne Bay near Miami (“Surrounded Islands,” 1983).
“We want to create works of art of joy and beauty, which we will build because we believe it will be beautiful,” Jeanne-Claude said in a 2002 interview. “The only way to see it is to build it. Like every artist, every true artist, we create them for us.”
Jeanne-Claude Denat de Guillebon was born on June 13, 1935, in Casablanca, where her father, an officer in the French military, was stationed. After attending schools in France and Switzerland, she earned a baccalaureate in Latin and philosophy in 1952 from the University of Tunis.
In addition to her husband, she is survived by their son, Cyril Christo.
After working with stacked oil barrels, Jeanne-Claude and Christo moved to New York in 1964 and embarked on ever more daring projects, grander in scale and more theatrical in conception. Seemingly, there was nothing too large to be wrapped. In the late 1960s, they wrapped the Kunsthalle in Bern, one of many buildings to come. At the Documenta exhibition in Kassel, Germany, in 1968, they erected, with the assistance of two giant cranes, an inflated cylindrical fabric “package,” in appearance a bit like a stretched-out Michelin Man, that stood nearly 280 feet tall.
The collaborations became communal events, during construction and after. Enormous numbers of viewers were attracted to “The Umbrellas,” installed simultaneously in Ibaraki, Japan, and at the Tejon Ranch in Southern California in 1991. “The Gates,” a series of flapping bannerlike panels installed in Central Park in 2005, also attracted big crowds during the two weeks that the work lasted, with each visitor handed a small sample of the saffron fabric.
Before Jeanne-Claude’s death, she and Christo were at work on two projects: “Over the River,” a series of fabric panels to be suspended over the Arkansas River in Colorado, and “The Mastaba,” a stack of 410,000 oil barrels configured as a mastaba, or rectangle with outward-sloping sides, envisioned for the United Arab Emirates.
Like all of their projects, these were intended to be temporary, a quality at the heart of the artistic enterprise. Whether executed in oil drum or brightly colored fabric, the art of her and her husband, Jeanne-Claude said, expressed “ the quality of love and tenderness that we human beings have for what does not last.”
The New York Times
오늘 자 뉴욕타임즈에 한국출신의 입양아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Adopted From Korea and in Search of Identity'라는 제목에서 짐작되듯 입양아들의 정체성 문제가 주요 이슈인데
기사 소개에 앞서, 제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부는 사회적인 여건이 어떻든 간에 내 나라의 아이를
외국에 내 보내는 짓만은 제발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하자느니 4대강을 살리자니 따위의 구호가
이들 앞에서 그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알고나 있을까 싶다.
아래는 1961년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김은미영이란 여성의 사진이다.
아마 한국 이름을 잃지 않도록 부모님이 본명에 Young이란 성만 붙인거 같은데 오히려 본인은 이게 싫었던가 보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두 남동생을 비롯해 주변과 자신이 다른 것에 불만이 많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일부러
사다주신 한국과 관련한 음반이나 그림책 마저도 거들떠 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10대 시절에도 그녀는 주변에 아시안들이 있었음에도 데이트 상대로 오직 백인 남자 아이들만을 선택했다.
같은 아시안끼리 어울리는 것이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까 두려워서였다고 한다.
결국 그녀의 나이 30대 처음으로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자신을 찾아나섰다.

두 남동생과 함께 찍은 김은미영씨 그리고 현재의 김은미영씨 모습
익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해 온 해외 입양아의 이야기라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에 별다른 감흥을 못 느낀다.
혹은 성공지상주의 발로에서 비록 반쪽이라도 하인즈 워드같은 유명인사 정도는 되어야 코리안이라는 칭호를
기꺼이 수여하는 풍토에서 김은미영씨같은 입양인들은 그저 먼나라에 사는 외국인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뉴욕의 비영리 입양조사기관 에반스 B. 도널드슨 입양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은미영씨와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온 입양아들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한다.
한국인 입양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연구되어진 이번 보고서 통계에 의하면 전체 입양인들 중 약 78퍼센트의
한국출신의 입양아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백인이라 믿거나 백인이되기를 소망해왔고, 60퍼센트의 입양인들이
중학교 시절 이후부터 자신의 인종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61퍼센트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국문화와 친부모를 찾기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을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미국 내 거주 한인의 10%라고 하니 입양인들만 10만명이 넘는 수치인 것이고,
입양이 시작된 195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6만명의 한국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졌다고 하니 그 대부분이
미국에 입양되어 살고있는 것이다. 참고로 입양에 있어 한국은 미국의 최대 해외입양국가이다.

김은미영씨의 1961년 입양당시 미국비자와 한국에서 가져온 그녀의 물품인 수저와 젓가락 반벌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라는 이들 대부분은 성장과정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하는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에게서도 그런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차별적인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소수만이 같은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위안을
느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에 거주 한국인이 적기때문에 그럴만한 기회를 얻기 힘든게 사실이나, 전에도
얘기했듯이 실제 한국인 가정이나 다른 한국 입양아들이 근처에 살아도 그들 스스로가 교류를 원치 않는다.
미국인 부모가 나서 아이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일부러 한국인 가정과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입양된
아이들은 같은 인종과 어울리는 것에 정체적인 혼란을 겪기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생후 7개월에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하이디 웨이츠먼은 그녀의 양부모가 뿌리를 잃지말라고 문화캠프에도 보내고
다른 한국인 입양가정과도 교류를 했지만, 자신이 한국인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걸 원치 않았고 스스로가 백인이라
생각했기때문에 정작 자신을 위한 양부모의 노력을 몹시도 싫어했다고 회상한다.
결국 그녀도 김은미영씨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 이후에야 자신이 인종적으로 한국인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문제는 미국 내 가정에도 존재하는 듯 하다.
고국을 찾는 해외 입양인들의 사연을 보면 그들의 뒤에는 모국에 대한 끈을 놓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려하는
훌륭한 양부모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반면에 완전히 자신의 가정에 아이가 동화되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적지않다.
부모가 모국에 대한 문화적 배려없이 미국적인 가정으로 아이를 흡수해버리면 위에 열거한 정체적인 혼란이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더욱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런 가정의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어 정체성을 찾기위해 모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다툼이 일기도 한다.
1979년, 미네소타의 한 마을에 입양된 제니퍼 타운은 대학시절 자신의 과거를 찾기위해 한국에 가고자한다고
얘기를 꺼냈을때 부모로부터 '미친짓'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마치 그녀의 행동을 가족에 대한 배신이나
배반쯤으로 여기는 듯 했다고 그 때를 회상했다.
더불어 모국을 찾은 입양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한국을 방문해 직접 보고 느끼는 것들이 놀랍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고 한국문화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다른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심지어 자신의 외할머니를 만난 한 입양인은 정작 자신을 해외로 입양보낸 외할머니로부터 한국말을 왜 배우지
않았느냐는 꾸중과 함께 다음에 볼때는 꼭 한국말을 배워오라는 당부를 했다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정서로 볼때 그 외할머니의 말은 가슴 메어지는 답답함의 토로였겠지만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의 말미에 1976년 미네소타 클라리사의 한 백인 가정에 입양되었던 소냐 윌슨은 이번 연구를 언급하면서
아이들 입양에 관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한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책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2008년 입양아동의 수치를 보니 해외입양이 1,250명 그리고 국내입양이 1,306명으로 집계되었다.
비교우위에 있어 국내입양이 점차 나은 수치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국을 떠났다.
그들 대부분이 불과 몇 년 이내에 지난 50여년간 16만명의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답습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닌 그들은 또한 미국인도 독일인도 프랑스인도 아닌채 그곳에서 살아갈 것이다.
Adopted From Korea and in Search of Identity
November 8, 2009
By RON NIXON
As a child, Kim Eun Mi Young hated being different.
When her father brought home toys, a record and a picture book on South Korea, the country from which she was adopted in 1961, she ignored them.
Growing up in Georgia, Kansas and Hawaii, in a military family, she would date only white teenagers, even when Asian boys were around.
“At no time did I consider myself anything other than white,” said Ms. Young, 48, who lives in San Antonio. “I had no sense of any identity as a Korean woman. Dating an Asian man would have forced me to accept who I was.”
It was not until she was in her 30s that she began to explore her Korean heritage. One night, after going out to celebrate with her husband at the time, she says she broke down and began crying uncontrollably.
“I remember sitting there thinking, where is my mother? Why did she leave me? Why couldn’t she struggle to keep me?” she sai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journey to find out who I am.”
The experiences of Ms. Young are common among adopted children from Korea, according to one of the largest studies of transracial adoptions, which is to be released on Monday. The report, which focuses on the first generation of children adopted from South Korea, found that 78 percent of those who responded had considered themselves to be white or had wanted to be white when they were children. Sixty percent indicated their racial identity had become important by the time they were in middle school, and, as adults, nearly 61 percent said they had traveled to Korea both to learn more about the culture and to find their birth parents.
Like Ms. Young, most Korean adoptees were raised in predominantly white neighborhoods and saw few, if any, people who looked like them. The report also found that the children were teased and experienced racial discrimination, often from teachers. And only a minority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felt welcomed by members of their own ethnic group.
As a result, many of them have had trouble coming to terms with their racial and ethnic identities.
The report was issued by the Evan B.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a nonprofit adoption research and policy group based in New York. Since 1953,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adopted more than a half-million children from other countries, the vast majority of them from orphanages in Asia, South America and, most recently, Africa. Yet the impact of such adoptions on identity has been only sporadically studied. The authors of the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study said they hoped their work would guide policymakers, parents and adoption agencies in helping the current generation of children adopted from Asian countries to form healthy identities.
“So much of the research on transracial adoption has been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adoptive parents or adolescent children,” said Adam Pertman,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We wanted to be able to draw on the knowledge and life experience of a group of individuals who can provide insight into what we need to do better.”
The study recommends several changes in adoption practices that the institute said are important, including better support for adoptive parents and recognition that adoption grows in significance for their children from young adulthood on, and throughout adulthood.
South Korea was the first country from which Americans adopted in significant numbers. From 1953 to 2007, an estimated 160,000 South Korean children were adopted by people from other countries, most of them in the United States. They make up the largest group of transracial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and, by some estimates, are 10 percent of the nation’s Korean population.
The report says that significant changes have occurred since the first generation of adopted children were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a time when parents were told to assimilate the children into their families without regard for their native culture.
Yet even adoptees who are exposed to their culture and have parents who discuss issues of race and discrimination say they found it difficult growing up.
Heidi Weitzman, who was adopted from Korea when she was 7 months old and who grew up in ethnically mixed neighborhoods in St. Paul, said her parents were in touch with other parents with Korean children and even offered to send her to a “culture camp” where she could learn about her heritage.
"But I hated it,” said Ms. Weitzman, a mental health therapist in St. Paul. “I didn’t want to do anything that made me stand out as being Korean. Being surrounded by people who were blonds and brunets, I just thought that I was white.” It was not until she moved to New York after college that she began to become comfortable with being Korean.
"I was 21 before I could look in the mirror and not be surprised by what I saw staring back at me,” she said. “The process of discovering who I am has been a long process, and I’m still on it.”
Ms. Weitzman’s road to self-discovery was fairly typical of the 179 Korean adoptees with two Caucasian parents who responded to the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survey. Most said they began to think of themselves more as Korean when they attended college or moved to ethnically diverse neighborhoods as adults.
For Joel Ballantyne, a high school teacher in Fort Lauderdale, Fla., who was adopted by white parents in 1977, the study confirms many of the feelings that he and other adoptees have tried to explain for years.
“This offers proof that we’re not crazy or just being ungrateful to our adoptive parents when we talk about our experiences,” said Mr. Ballantyne, 35, who was adopted at age 3 and who grew up in Alabama, Texas and, finally, California.
Jennifer Town, 33, agreed.
“A lot of adoptees have problems talking about these issues with their adoptive families,” she said. “They take it as some kind of rejection of them when we’re just trying to figure out who we are.”
Ms. Towns, who was adopted in 1979 and raised in a small town in Minnesota, recalled that during college, when she announced that she was going to Korea to find out more about her past, her parents “freaked out.”
“They saw it as a rejection,” she said. “My adoptive mother is really into genealogy, tracing her family to Sweden, and she was upset with me because I wanted to find out who I was.”
Mr. Ballantyne said he received a similar reaction when he told his parents of plans to travel to Korea.
The Donaldson Adoption Institute’s study concludes that such trips are among the many ways that parents and adoption agencies could help adoptees deal with their struggle with identity and race. But both Ms. Towns and Mr. Ballantyne said that while traveling to South Korea was an eye-opening experience in many ways, it was also disheartening.
Many Koreans, they said, did not consider them to be “real Koreans” because they did not speak the language or seem to understand the culture.
Mr. Ballantyne tracked down his maternal grandmother, but when he met her, he said, she scolded him for not learning Korean before he came.
“She was the one who had put me up for adoption,” he said. “So that just created tension between us. Even as I was leaving, she continued to say I needed to learn Korean before I came by again.”
Sonya Wilson, adopted in 1976 by a white family in Clarissa, Minn., says that although she shares many of the experiences of those interviewed in the study — she grew up as the only Asian in a town of 600 — policy changes must address why children are put up for adoption, and should do more to help single women in South Korea keep their children. “This study does not address any of these issues,” Ms. Wilson said.
Ms. Young said the study was helpful, but that it came too late to help people like her.
“I wish someone had done something like this when I was growing up,” she said.
사진 및 기사 출처
The New York Times
화요일인 그저께 저녁, 폭염 속에 느닷없이 강한 번개와 천둥이 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줄기에 놀라 창밖을 바라보는데 매서운 바람까지 불었다.
어찌나 강하게 바람이 부는지 집 앞 아름드리 가로수가 연신 부채질을 해대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뽑힐 기세였고
흡사 집단 다구리를 당하는 것처럼 바람의 방향 또한 종잡을 수 없이 사방에서 불어왔다.
태어나서 눈 앞에서 본 가장 매서운 바람이었던 것 같다.
다음 날 별 생각없이 산책삼아 센트럴파크에 나섰는데 공원 담장을 넘어 수 많은 나무들이 넘어져있다.
불과 십여분 밖에 불지 않은 바람이라 별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강한 돌풍이었나 보다.

공원 입구로 들어서니 이건 부러진게 아니라 아주 찢겨진 나무들이 여기저기 즐비하고, 아름드리 나무들은 아예
뿌리가 뽑힌 채로 인도를 배게삼아 누웠다. 그리고 자주가는 Great Hill은 모든 진입 구역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그 외에 왠만한 소로들 역시 진입이 불가능했다.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를 보니 이날 돌풍의 최고 속도가 시속 113Km 였다고 한다.
그리고 공원 안에서 쓰러진 나무들만 백여그루이며 수 백 그루는 아래 사진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런 피해는 서쪽 허드슨 강변의 리버사이드 파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헌데 강 건너 뉴저지에 사는 지인들은 별 다른 피해가 없었다니 국지적인 돌풍이었나 보다.


산책길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다 집에서 가까운 지역만 돌아 본터라 실질적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아마 다음 주는 넘어야 복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아래 사진은 저녁 무렵이면 늘 아내와 산책 삼아 걷는 예쁜 길인데 완전히 길이 막혀버렸다.
몇몇 사람들은 나무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내부는 아마도 피해가 더 심한 듯 했다.
아무튼 이래서 미국에서는 바람이 강한 날 숲 속에 있거나 차를 타면 절대 안된다.
실제 주행중이던 차에 나무가 덮쳐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심심치 않게 들린다.

Brief, Violent Storm Turns Central Park Into an Obstacle Course of Downed Trees
August 19, 2009
By SEWELL CHAN and SARAH MASLIN NIR
A London plane tree toppled across the East Drive. Near the Tennis Center, a gingko lay in splinters, while a huge oak was sprawled across a chain-link fence. On the Great Hill, nearly a dozen once-stately American elms were uprooted or shattered.
Nearly 100 trees were felled in Central Park and hundreds more were damaged on Tuesday night, many fatally, during a fierce thunderstorm that moved over New York City. It was the most severe destruction the park’s trees had sustained in decades, said officials at the city’s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and at the Central Park Conservancy, which manages the park.
“Central Park has been devastated,” Adrian Benepe, the city parks commissioner, said Wednesday. “It created more damage than I’ve seen in 30 years of working in the parks.”
The fast-moving storm was described as a microburst, or downburst, with straight-line winds gusting at 70 miles per hour. It was severe in some parts of the city, unnoticed in others. And while it felled trees elsewhere — though, remarkably, there seemed to be no serious injuries — the sudden, selective deforestation of a wide swath of Central Park left at least some users with a surprisingly deep sense of loss.
“I’m humbled by what nature can do,” said Donna Castellano, the director of operations in the cardiology department at Mount Sinai Hospital, who took pictures of the fallen elms, lindens and poplars along her daily exercise route. “You realize how vulnerable you really are. We’re not going to be around in 80 years when they grow back.”
The damage, which was concentrated in the northern third of the park, included pin oaks, American elms and tulip trees dating to the turn of the last century; a horse chestnut tree near Central Park West at 100th Street; and dozens of other well-loved specimens.
Fallen limbs and branches forced the temporary closings of the Tennis Center, the ball fields of the North Meadow, the Conservatory Garden and parts of the Bridle Path.
Trees in several other parks — Riverside Park on the Upper West Side, Thomas Jefferson Park in East Harlem and Randalls Island among them — also were significantly damaged. Large tree limbs fell onto the Cross Island Parkway in northern Queens and onto Pelham Parkway, near Co-op City in the Bronx. Penny-sized hail was reported in the East Tremont section of the Bronx and in Hoboken, N.J.
Forestry crews began doing damage assessment at 2 a.m. Wednesday in Riverside Park and later moved on to Central Park. To start the cleanup work, the conservancy brought in crews from companies like Beucler Tree Experts, and by Thursday, the Parks Department expects to have at least 10 crews working in the park.
Neil Calvanese, vice president for operations at the conservancy, which has managed the park since 1981, said workers would inspect many of the park’s 24,130 trees for loose and dangerous branches. He predicted that hundreds of trees will have to be removed, their stumps ground into wood chips and the soil replanted to prevent invasive species — like Norway and sycamore maples and Japanese knotweed — from taking root.
Despite the intense damage, the storm, which lasted from 9:55 to 10:30 p.m., was not a tornado, said David Wally, a National Weather Service meteorologist. The damage in Central Park, he said, was caused by strong wind, not the violently rotating columns of air characteristic of tornadoes.
The storm was part of a weather system that formed over New Jersey and quickly moved eastward. “It seems like Central Park was essentially the ground zero,” Mr. Wally said. “Manhattan, the Bronx and the northern part of Queens were the primary recipients of the severe weather.”
Mr. Benepe went out to Riverside Park after the storm. “There was a very distinct odor of shredded fresh trees, and it’s not a good smell,” he said. “It’s a smell of living trees that had been blown apart. To me it looked like pictures I had seen of war zones, of trees I had seen that had been hit with artillery shells. Some were split in half, halfway up their trunk, others completely uprooted. If you love trees, as we do, it’s emotionally upsetting. You hav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certain trees and now they are gone.”
By the late afternoon, the growl of chain saws was a counterpoint to the laughter of summer-camp groups playing with water balloons on the North Meadow. From the outer rim of the jogging path around the Jacqueline Kennedy Onassis Reservoir, trees jutted onto the Bridle Path a few feet below. On the East Drive near 88th Street, a park worker stood by metal barricades and caution tape, turning back cyclists and joggers. Farther along the drive, a traffic light sat cockeyed on its pole, still flashing from green to yellow to red.
Some joggers, like Edem Tsakpoe, who sprang over a waist-high metal gate onto the Bridle Path, ignored the warnings. Though concerned about falling branches, he said, “I have good reflexes.”
Joseph Bristol, 12, and his mother, Annette, who live at 106th Street and Madison Avenue, went out with their digital camera. “I wanted to see how powerful the forces of nature are,” said Joseph, who marveled at the wrecked trees. “Some broke in half, some were just leaned over, some were cracked right down the middle.”
Asked what he would do with the photographs, he replied, “I hope I can look them over and really wonder.”
The New York Times
한국에 있을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야채나 과일을 싣고 동네를 지나는 트럭을 보곤했다.
걔중에는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농부들도 있어 신선한 상품을 쉽게 구할 수도 있었는데
뉴욕도 이와 다르지 않아, 농장주들이 직접 차를 몰고 와 판매를 하는 장이 도심 여러 곳에서 열린다.
헌데 트럭 자체가 아예 농장이 된다면 어떨까?
며칠 전, NY1 채널 뉴스에서는 오래된 소형 트럭의 짐칸을 이용해 채소를 키우는 농부들을 소개했는데
짐칸에 양분이 담긴 흙을 깔고 그 위에 토마토며 당근, 오이, 상추 등을 키워 판매를 하는 형태였다.
어떤 화학적인 약품이나 농약을 쓰지 않는 이 텃밭의 가장 큰 장점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트럭 텃밭의 주인은 예일대 동창이자 현재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커트 앨리스 Curt Ellis
와 이언 체니 Ian Cheney 두 사람으로, 미국의 심각한 비만과 당뇨문제를 보면서 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이 필요함을 주지시키고자 이 텃밭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자신들의 작농 과정을 필름에 담고
있으며 이런 새로운 시도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에 신선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수확하는 농산물 대부분이 선주문 고객들에게 팔리고는 있지만, 대량생산이 힘들고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찾긴 힘들다. 하지만 척박한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도전적이고 의미있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우리에겐 중요한 듯 싶다.
아래는 영상은 이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필름의 티저이며 두 개의 에피소드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된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Truck Farm을 만드는 동기와 과정을 재미있게 보여주며, 두 번째 에피소드는 물리학을
전공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설치한 태양열 충전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매시간 촬영한 농작물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며 더불어 NYU의 식품영양학 교수인 Marion Nestle의 Truck Farm에 대한 감흥을 엿볼 수 있다.
Episode 1 보기 / Episode 2 보기
A "Truck Farm" Grows In Brooklyn
August 11, 2009
By Kafi Drexel
A vegetable garden grows in Brooklyn, but it's being hauled around in the back of an old 1986 Dodge Ram pickup. The plant-laden truck, called "Truck Farm," only gets about 12 miles to the gallon, but now it is providing its own kind of fuel.
"Truck Farm" is the brain child of Brooklyn residents Curt Ellis and Ian Cheney, two documentary filmmakers who graduated from Yale.
"We think Truck Farm may be the last great hope for Detroit," says Ellis. "The big three automakers are hurting and I think the answer might be to come up with the greenest car of all for their next design, which is a car with a garden in the bed."
Part-public arts project, part-community food source and part-educational tool, the two urban farmers planted their first crop of vegetables in the truck bed in May and are simultaneously working on a short film about their mobile harvest.
Joining the local foods movement, they say the goal is to help demonstrate the healthy benefits of being able to plant and grow one's own food and to prove it can be done anywhere.
"We've noticed neighborhoods all across New York City, many of them have limited access to fresh fruits and vegetables. And we see the sky rocketing rates of obesity and Type 2 diabetes," says Ellis. It seems like part of what we need to do to fix the problem is to get more fresh, healthy food available to people."
The old truck inherited from Cheney's grandfather that used to cart futons around in their college days now sprouts lettuce, arugula, peppers, broccoli, tomatoes and more.
"The first tomato of the season was actually plucked by the guy pumping gas down by the [Brooklyn-Queens Expressway], and he said it tasted pretty good," says Cheney. "I think for the most part Truck Farm helps people pause and think, "Where might I be able to grow food?"
Since May, Ellis and Cheney have harvested more than two full shopping carts of produce. They also shot time-lapse video that shows the progress of their crops. Most of their harvest has wound up on the plates of community members who pay for the vegetables ahead of time.
Onlookers can't help but give it a stamp of approval.
"It's different, it's a truck with a garden inside of it - real fruits, real tomatoes. I think it's nice," said a neighbor.
Truck Farm roams the streets of Park Slope or Red Hook, Brooklyn.
NY1.com
서울을 비롯해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도시이다.
미국의 뉴욕 그 중에서도 심장이라 불리는 맨하튼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데
그 중 집세는 가계 지출의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다. 서울과 달리 미국에는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지불하며 살아야하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어퍼 웨스트 지역의 경우 각각 분리된 거실,
주방이 달린 살만한 원룸 아파트가 최소 2000불 이상이다. 지금 환률로 따지면 한달에 200만원이 넘는 돈이
집세로 나간다는 얘긴데, 기혼자의 경우 30%, 미혼자의 경우 수입의 40% 가까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환경에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나마 금융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올해 초부터 렌트 비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당연한 것이 증권가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도산이나 인원삭감 등으로 자리를 잃고 물가 높은 뉴욕을 떠나니
세입자를 잃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하향적 경제붕괴마저 연쇄적으로 일어나 전체적인 아파트
렌트 시장이 얼어붙게 된것이다. 결국, 적게는 100불에서 많게는 500불까지 렌트비가 하향조정되었고
기존 세입자의 경우 매년 오르던 렌트비용 계약이 동결되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렌트비가 떨어졌다하더라도 여전히 집세는 가계 경제에 비출때 버겁다.
그럼, 모든 맨하튼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
연방정부를 비롯해 주정부, 시의회는 집주인이 함부로 집값을 올려 세입자를 궁지에 몰고 사회에 경제적인 폐해를
주는 것을 막기위해 오랜 역사에 걸쳐 렌트 비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있다.
이런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Rent stabilized apartment라고 하는데, 현재 적용되는 제정 내용에 따르면
월세의 상승률을 1년 계약시 현 월세의 4.5% 이상, 2년 계약시 7.5% 이상은 못 올리도록 규정되어있다.
물론, 모든 아파트들이 이런 규정을 받는 건 아니고, 거주자의 거주기간이나 아파트의 건립연도, 건물 내에 살고있는
총 가구수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어진다. 일례로, 아파트의 월세가 2000불을 넘고 2년간 수입이
175,000불 이상이면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 그대로 건물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 보면 되겠다.

오늘 자 뉴욕 타임즈는 이 규정에 대한 집주인들의 반발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이 렌트 규제법 Rent control law 에 묶이면, 일년에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으로만 몇 만불씩을 지불하면서도 충분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하니 렌트비용 상한제도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번 비용을 건물보수에 투자해야하니 볼멘 소리가 가득하다.
최근에는 이런 건물주들이 연합해 향후 예정된 렌트 규제법의 상한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라디오 광고를 통해
동정적인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배경에는 악화된 현 경제상황에서 자칫 렌트 비용 인상이 동결되거나
혹은 하향조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숨어있다. 일부 건물주들은, 만약에 하나 렌트 비용 인상률이 동결된다면
뉴욕시 역시 건물주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를 동결할 각오를 하라며 시장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있는 상황이다.
세입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단합된 모습으로 건물주들의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시위나 공개표명을 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인상폭 동결에 대한 근거로 어려워진 경제로 인한 가계수입의 불안정을 내세우고 있다.
만인에게 공평한 법이란 사실상 없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해 오고는 있지만, 일부 건물주들의 경우, 세입자가 집을 나가게
되면 렌트비용을 최대한 20%까지 올릴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 갖은 수단을 동원해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는가
하면 리노베이션을 통해 우회적으로 월세를 올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1년 수입이 9만불인 고소득 세입자가
이런 정책의 보호 아래, 방이 세 개나 달린 아파트에 살면서도 매달 7백불도 안되는 월세를 내면서 렌트비 인상에는
열을 올리기도 한다.
건물주들의 억울한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추위와 더운 열을 피해 숨 돌릴 수 있는
집이 있기에 내게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수 많은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더 간절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법을 통해서라도 가진 자에게 더 베풀 것을 강요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을 바라 보자니
자연스레 같은 어려운 경제시기를 거치면서도 경제 부흥의 명목 아래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버리고, 살고있는
사람들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못 뜯겨진 쌍쌍바처럼 참 쉽게 대비된다.
In a Campaign to Raise Rents, an Attempt to Humanize Landlords
June 22, 2009
By MANNY FERNANDEZ
When the board that regulates rents for New York City’s rent-stabilized apartments met to vote on increases last year, tenants more than outnumbered landlords. They drowned them out, smuggling in hundreds of plastic whistles that rattled the nerves and rang the ears of landlords.
But in the days leading up to this year’s vote on Tuesday evening, landlords have had no problem being heard. The views of five property owners are getting frequent airtime on two popular radio stations, part of an ad campaign paid for by the Rent Stabilization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thousands of landlords of rent-stabilized apartments.
In folksy tones, the five men and women describe themselves as small landlords who own only one or two buildings. And they talk, as birds chirp in the background, about their high costs.
One landlord, Ernst Endrich, a retired transit worker who owns two small buildings in the Bronx, says in an ad, “I pay $50,000 in property taxes and water rates.” Another, Constance Nugent-Miller, a nurse who owns a six-unit building in Crown Heights, Brooklyn, that has been in her family since the mid-1950s, says: “I use my second income as a nurse to pay fuel bills and make repairs. I do what it takes to provide quality housing my tenants can afford.”
To executives at the association, the 60-second ads humanize their argument that the costs of owning and operating rent-stabilized units have outpaced the board’s annual increases, by putting a face, or at least a voice, on residential landlords, a group that often cedes the spotlight to tenants. To tenants and their supporters, the ads are an unsuccessful attempt to convince the public that the landlords are not making significant profits.
The nine-member board, known as the Rent Guidelines Board, approves the size of rent increases for the city’s one million rent-stabilized apartments, in what are typically raucous meetings punctuated by shouting matches, booing and name-calling. Last year, the board approved its highest set of allowable rent increases since 1989 — 4.5 percent on one-year leases and 8.5 percent on two-year leases.
This year, because of last year’s increases and the economic recession, the run-up to the board’s vote on Tuesday has been unusually intense.
The radio ads are the first for the Rent Stabilization Association since 1997, when a political battle was brewing in Albany as the state’s rent laws were set to expire. “The backbone of the housing in the city are really small guys who have a different story to tell, versus the big owners,” said Joseph Strasburg,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ey know their tenants. They know them very well and they run decent buildings.”
About 27 percent of the new York City’s rent-stabilized apartments are in buildings with 19 or fewer units, according to the city’s 2008 Housing and Vacancy Survey.
Mr. Strasburg declined to say how much the ad campaign cost.
Tenants and a number of elected officials have mounted a loose-knit campaign of their own, gathering signatures, calling 311 and rallying to push the board to authorize a rent freeze, in part because of the state of the economy. Since the board was established in 1969, it has never approved a rent decrease or a rent freeze.
On Tuesday, many tenant activists plan to rely not on whistles but on tape: They will tape their mouths shut during the meeting to protest what they consider the board’s disregard for their concerns.
“I think it’s time to talk about extraordinary measures,” said City Councilman Bill de Blasio, a Brooklyn Democrat. “If we can do bank bailouts and other government actions we never would have dreamed of, we certainly should talk about freezing rent increases.”
Some of the landlords featured in the ads said that if the board approved a rent freeze, it would only be fair for the mayor to freeze property taxes as well.
Ms. Nugent-Miller, 44, said she owed the company that provided her building’s heating oil about $17,000. Peter Petrov, 32, who owns a 55-unit building in the Norwood section of the Bronx, said that by the end of July, he will have paid about $60,000 in property tax and water and sewage bills. He said one of his tenants, a man who he says earns $90,000 a year, lives alone in a three-bedroom apartment. His rent is $696 a month.
“His rent is probably going to go up 25 bucks,” Mr. Petrov said, adding: “Tenants feel they have this entitlement to affordable housing, but it’s on the sacrifice of the landlords’ back. It’s not fair.”
The New York Times
이란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일 국제사회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 도중 수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한데 이어 어제는 시위대와는 상관없는 한 소녀가
총탄에 맞아 숨지는 참혹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 현 이란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이란 정부는 모든 외신기자들의 시위현장 접근을 봉쇄하고 인터넷 접속마저 차단시켜버렸다.
오늘 자 뉴욕타임즈는 이란 정부의 이런 통신 억압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말하고 있다.
국외로의 정보 유출이 가능한 모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상태이지만, 이미 외국의 인터넷 유저들은 차단을
우회해서 글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란의 유저들에게 알리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결국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져만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바로 '귀여운 고양이 이론 The cute cat theory of digital activism'이 자리하고 있다.
하버드 법대의 한 연구기관인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수석연구원 Ethan Zuckerman에 의해
처음 주창된 이 이론에 따르면 한 정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 아래, 시민들의 양심에 따른 반 정부적 행동을 억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억제한다면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함께 피해를 입는 다수가 그 부정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 더 큰 저항과 직면하게 될 거라는 요지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귀여운 아기 고양이 사진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을만큼 사랑스럽다.
이런 사진들은 인터넷의 다양한 개인적, 혹은 커뮤니티적인 사이트를 타고 쉽게 공유되며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기때문에 재미난 동영상이나 글과 더불어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동기를 부여한다. 오래 전 'O양 비디오 사건'이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떠올려보자.
한편, 인터넷 공간에는 소수만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도 존재하는데 그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견해를
채팅이나 게시판, 블로그에 올려 올바른 생각들을 풀어낸다. 경우에 따라 그런 일련의 활동은 인터넷 바깥 공간으로
까지 확대되어 촛불집회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형 시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만약, 정부가 이런 소수의 양심적 행동을 반 정부적인 행동으로 규정하여 사이트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강화하거나
아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면,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공유하고 그저 순수하게 동호회 활동만을 하던 사람들 또한
그 소수와 함께 억압적인 정책의 피해자가 되어 결국 미처 듣지 못했던 소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더욱 큰 세력으로 커진 저항에 직면해 점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 2.0이 가지는 큰 힘인 것이다.

얼마전 진중권 교수가 정치적인 인터넷 검열을 피해 구글의 블로그에 둥지를 틀었다.
더불어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체 혹은 알 수 없는 힘을 통한 검열이 있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급기야 검찰은 한 방송국 PD의 사적인 메일까지 검열해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까지 여론몰이를 위해 공개했다.
이란의 현 모습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만 들리지 않는 것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닐거라 생각한다.
As Blogs Are Censored, It’s Kittens to the Rescue
June 21, 2009
By NOAM COHEN
TO censor the Internet painlessly, undetectably, is the dream that keeps repressive governments up late at their mainframe computers. After all, no users are so censored online as those who never see it.
The Iranian government is carrying out an Internet crackdown in hopes of subduing the protest movement that has surged since the disputed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June 12. At the same time, the Iranian government has been sending out the police to restrain protesters and foreign journalists.
Thus far, however, the Iranian government has learned the difficulty of trying to control the Internet in half-steps. Because the government’s censorship efforts are so evident — transparent, even — there is a battle raging online to keep Iran connected to the world digitally, and thus connected to the world. Sympathizers around the world are guiding Iranians to safe access to the Internet and are hosting and publicizing material that is being banned within Iran.
If only Iran’s leaders had thought through the implications of what can be called the Cute Cat Theory of Internet Censorship, as propounded by Ethan Zuckerman, a senior researcher at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 His idea is deceptively simple: most people use the Internet to enjoy their lives, and among the ways people spread joy is to share pictures of cute cats. Even the sarcastic types (who, for example, have been known to insert misspelled messages under pictures of kittens) seem to be under their thrall.
So when a government censors the Internet, it had better think twice: “Cute cats are collateral damage when governments block sites,” Mr. Zuckerman wrote for a recent talk. People who could not “care less about presidential shenanigans are made aware that their government fears online speech so much that they’re willing to censor the millions of banal videos” and thereby “block a few political ones.”
As it happens, Mr. Zuckerman said, the Iranian government’s censorship task has been made harder because there is a thriving blogging community there, which he attributes to an earlier Iranian censorship campaign against traditional print media, in 2003. Writers flocked to the Internet. This fact, combined with a history of blocking access to social media tools since at least 2004, means that a large group of computer-savvy communicators “have had five years to figure out” how to get their message out.
They have learned about all manner of “proxies,” that is, improvised ways of evading censorship — often connecting to a computer outside of Iran, which then can connect to the Internet freely. In earlier cases, the important news that bloggers had to share on a social network might have related to soccer, or a certain favorite pet, but today those same tools are used to get the word out about protests and a spirit of defiance within Iran.
From his experience as a founder of Global Voices, an aggregator of citizen media from around the world, Mr. Zuckerman says he has learned to value the roots laid down by a community of bloggers.
In Kenya, he said, bloggers were important commentators and reporters in 2007-8 on a disputed election, and people would ask why there were so many bloggers in Kenya.
It turned out, he said, that “Kenya has the second-most bloggers in Africa and that mostly they are not writing about politics; many are writing about rugby.” There was, he said, “a fascinating latent capacity — people who knew how to use the tools, knew how to write well, to tell a story with words and pictures.”
The Russia-Georgia war, he said, offered a contrast.
“Suddenly a bunch of people flocked to blogging tools,” he said. “We had never heard about of lot of those people. A number of people were manufacturing blogs from whole cloth for propaganda purposes. It was hard to know who they were, if they were credible. In Kenya, we knew who they were; we knew their favorite rugby team.”
There are practical benefits to the mainstreaming of political protest online. It presents another barrier to censorship.
Mr. Zuckerman said there had been discussion about having a dedicated human rights site — “and we realized that it will be the most attacked site in the world,” he said.
“The response,” he said, “is to say let’s go in the other direction — encourage anyone that has a human rights site to mirror it everywhere, including sites like Blogspot.com with lots of noncontroversial sites. It is kind of hard for Iran to block Blogger.com well, not that it is hard, but it is complicated. They would have close down a lot of blogs, including blogs with cute cats.”
Beyond the practical benefits, there is something satisfying about a country being assisted by ordinary bloggers who suddenly show their skills in organizing and belief in basic political principles. It harks back to heroes like the Roman leader Cincinnatus, a farmer who had to be persuaded to lead the republic in a time of need and after succeeding quickly returned to the farm. Any functioning society needs professional politicians, just as any modern society needs political blogs, but it is good to be reminded that leadership and political voices can come from other ranks.
But, Mr. Zuckerman reminded me, “You have to have the sword at home. You don’t want to have to buy a sword at the last minute.”
The New York Times
블로그를 통한 맛집 평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널리 퍼져있다.
지역별로 맛집을 소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냉면이나 갈비 등 특정 메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곳도 있다.
사람사는 모습은 어디나 똑같은지 뉴욕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름하여 Burger of the Month Club 이다.

모임의 이름에 드러나듯 이들의 평가대상은 가장 미국적인 음식인 '햄버거'로,
뉴욕의 이름있는 혹은 숨은 햄버거를 찾아 자신들만의 평가기준 아래 햄버거 랭킹을 매기는 것이다.
평가기준은 고기와 빵, 치즈, 감자 후라이즈, 서비스 그리고 데코레이션 등 총 13가지 요소들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2 ~ +4 까지 점수를 주는 형식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시 햄버거의 맛, 품질 그리고
다시 찾을만한 곳인지 등의 8가지 항목을 분류해 최종 점수를 내는 것으로 최고의 햄버거를 선정하게 된다.

BOTM(Burger of the Month Club)이 탄생한 것은 2005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햄버거'를 먹기 위해
뉴욕에서 4시간 거리인 펜실베니아를 찾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4년간 빠짐없이 매달 월요일
하루를 정해 뉴욕의 햄버거 식당들을 순례해왔고, 더불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다.
www.burgerrankings.com
BOTM은 그 구성인원 수를 8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개의 뉴욕 레스토랑들이 단체 손님을 꺼리기 때문인데, 그나마 한 멤버가 오래곤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현재는 설립자인 Brett Weiss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햄버거 자체가 건강한 음식이
아니다보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구성원들이 다분히 비만적인 체형이고, 그 중 한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치료를 받는다니 조만간 6명으로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절대 닭고기나 칠면조 등 기타 육류가 들어간 햄버거는 먹지 않는다.
오직 소고기를 갈아 만든 패티를 넣은 햄버거만 이들의 평가대상에 들어가는 진정한 햄버거이며,
선별과정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은 햄버거 식당들을 추려낸 후, 다시 한번 랭킹에 오른
햄버거들을 먹고 최종 평가를 내려 베스트의 진위를 판가름 낸다고 한다. 일종의 플레이 오프 시즌이다.
아래 사진은 최근 랭킹에 오른 햄버거들로 좌에서 우로 각각,
1위를 한 Peter Luger, 2위 : Donovan's Pub, 4위 : Primehouse, 6위 : Burger Joint, 7위 : Landmarc,
10위 : Back Forty, 11위 : DuMont Burger, 13위 : Lure Fishbar, 26위 : Zaitzeff, 30위 : Shake Shack 이다.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무지 좋아하는지라 맨하튼 내의 여러 곳을 다니며 맛을 보곤하는데,
내가 찾은 곳 대부분이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식당이다 보니 랭킹에 든 식당들이 대부분 낯설다.
BOMT가 선정한 식당들은 대개 햄버거가 다른 메뉴들 사이에 서브로 자리한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다.
그래서 지난 번 부푼 꿈을 안고 브룩클린에 있는 Peter Luger를 찾았을 때도 정작 햄버거 가게가 아닌 것에
적잖이 당황했었다. Peter Luger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는 무지하게 유명하고
인기많은 레스토랑이었던 것이다.
결국 쓸쓸히 발길을 돌려 유니온 스퀘어에서 굿버거를 사먹고 돌아온 아픈 추억이 생각난다.
BOTM 선정, 햄버거 탑10
PETER LUGER : 178 Broadway (Driggs Avenue), Williamsburg, Brooklyn, (718) 387-7400.
DONOVAN’S PUB : 57-24 Roosevelt Avenue, Woodside, Queens, (718) 429-9339.
CITY HALL : 131 Duane Street (Church Street), TriBeCa (212) 227-7777.
PRIMEHOUSE : 381 Park Avenue South (27th Street), (212) 824-2600.
BOBBY VAN’S GRILL : 25 Broad Street (Exchange Place), Financial District, (212) 344-8463.
BURGER JOINT AT LE PARKER MERIDIEN : 119 West 56th Street, Midtown, (212) 245-5000.
LANDMARC : 179 West Broadway (Leonard Street), TriBeCa, (212) 343-3883.
GENESIS BAR & RESTAURANT : 1708 Second Avenue (88th Street), Upper East Side, (212) 348-5500.
BLACK IRON BURGER : 540 East Fifth Street (Avenue B), East Village, (212) 677-6067.
BACK FORTY : 190 Avenue B (12th Street), East Village, (212) 388-1990.
하위 랭킹에 포함된 비교적 유명한 햄버거 식당들
CORNER BISTRO (21ST)
RARE BAR & GRILL (44TH)
SHAKE SHACK (30TH)
THE SPOTTED PIG (41ST)
VESELKA (28TH)
Turkey Burgers Don’t Count
May 5, 2009
by JODI RUDOREN
ONE by one they approached the counter at Zaitzeff, a storefront in New York’s financial district, and repeated the words like a mantra. Half-pound sirloin burger. Bacon. Cheddar.
None of the seven men, still in neckties from the workday, dared order a turkey burger ($8.50 on the chalkboard menu). Nobody got the sliders ($12.50 for three). Not one request for Kobe ($9.75 for a quarter-pounder, $15.50 for a half).
“If anybody didn’t order a half,” Brett Weiss told the beefy guy taking it all down on a restaurant pad, “make them a half-pound anyway.”
Mr. Weiss, 33, operations manager for a software company, is the founder and de facto leader of the Burger of the Month Club, or BOTM (which he and his friends pronounce “bottom”). One Monday a month for the last four years, they have sampled a burger — bacon-cheddar whenever available — at a different New York restaurant.
They do not just eat the burgers, they rank them, compiling the averages on a Web site, burgerrankings.com, and competing through the year to see whose restaurant choice will wind up as the best-loved burger (winner gets ... nothing).
“Certain people like a steak-type burger, certain people like something thinner,” Mr. Weiss noted. “Do you rank a burger based on, ‘My friend came in from out of town, where should I take him?’ Versus, ‘If I had all 45 burgers in front of me sitting on a table, which one would I eat?’ That’s the healthy debate.”
Healthy, it’s not. In fact, one member is on injured reserve due to cholesterol.
(The club is capped at eight because that seems like the maximum one can reasonably expect to get seated at a restaurant; when new members join, they are expected to catch up by eating, and ranking, whatever burgers they have missed.)
In his 2006 application for admission, Jed Weiss, 34 — no relation to Brett or his older brother, Darren, 36, also a founding member — proclaimed, “Burgers to me are an art.”
“Vegetables are to be eaten by rabbits and liberals,” wrote Mr. Weiss, a lawyer who lives on the Upper West Side, “and the only form they should take is the fourth ingredient in a condiment.”
(Another would-be member, Dave Powers, submitted a résumé, on which he bragged about indoctrinating his son in the Way of the Burger; perfecting his palate over 15 years in Washington, D.C., Iowa and Charlottesville, Va.; and, back in the late 1970’s, beating Eric Vopova at a middle school contest by eating “16 sliders in 5 minutes under the bleachers” without getting sick. Mr. Powers was accepted but quit when he moved to Oregon.)
BOTM began in the summer of 2005, when Adam Beckerman, 32, called up Brett Weiss and said, “Let’s go eat the world’s biggest burger.”
“Adam, when we were younger and he was still single, used to call me all the time and be like, ‘Let’s do ... ’ and he didn’t have to finish the sentence because I’d say yes,” Mr. Weiss explained.
At the time, the world’s biggest burger was a 15-pounder on offer at Denny’s Beer Barrel Pub in Clearfield, Pa., about a four-hour drive from New York. Mr. Beckerman and Mr. Weiss grabbed two other hungry guys, found a raggedy golf course nearby and made a day of it: They even printed commemorative “Best Day Ever” golf balls with a burger and a golf tee.
Then they came home and started eating half-pounders.
Members take turns picking burger destinations, which must be accessible by subway. Most do online research as well as a taste test, since a bad pick can bring humiliation. Once each has picked, whoever picked the group’s favorites gets to pick a second time — this is known as the playoffs — and the best of those wins the year.
(The 2008 crown is in dispute: Primehouse had the year’s top burger, but it was picked by Brett Weiss, who some believe back-doored his way into the playoffs upon Mr. Powers’s departure.)
At first, each member rated each place -2 to +4 on each of 13 factors, including cheese, bun, manageability, fries, shake, service and décor. That got replaced by an A-F report card-style scale in eight categories, including taste, value and returnability.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the group had scratched all that and just ranked each burger against all the other burgers, constantly refining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lists, which Brett Weiss meticulously compiles.
“We came down to the point, why are we ranking service, why are we ranking décor, why are we ranking the bun and the fries when they reall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burger?” Mr. Weiss explained. “I think at this point if you put us on a picnic table in the middle of Central Park and brought us the burger, I think we’d all be happy.”
The Top 10 is a mix of usual suspects — like Peter Luger; Donovan’s Pub in Queens; and Burger Joint at Le Parker Meridien — and some surprises, like Genesis Bar & Restaurant on the Upper East Side and City Hall, a corporate lunch spot better known for its raw bar.
(J. G. Melon, a perennial on best-burger lists, is stuck around No. 20, revealing a split in the group: it is some members’ absolute favorite, but it has its detractors, including one who threw up after eating there, for no clear reason.)
At the bottom is Nolita House. “They wouldn’t put bacon on our burgers even though they had bacon,” explained Jason Beckerman, 33, a lawyer (and Adam’s big brother).
And Rare Bar & Grill on Lexington. “They put the sticks in the burger with the temperature, the name of the place implies that they know the temperature — all the temperatures were off!” complained Dave Becker, 34, a real estate developer.
One off-the-path success was Lure Fishbar, where a seafood chef confused by a table of burger-orderers came out to chat, was told the kitchen over-salted the fries, and sent out free ice cream sandwiches; it currently ranks 13.
“I went back there on a date,” Brett Weiss said. “He took care of me. Every two seconds he came out to check on me.”
Then there was Peter Luger. The Williamsburg, Brooklyn, steakhouse does not serve burgers at dinner, so the club met on Saturday for lunch. “The first guy ordered a burger, the second guy ordered a burger, the third guy is in the middle of ordering a burger, and he says, ‘Are you guys all ordering burgers? I don’t do burgers,’ ” Mr. Weiss recalled of the salty old waiter, who sent over a replacement in his stead. “We ordered steak as an appetizer, we all ordered dessert, left the guy like a $50 tip.”
There was no such drama at Zaitzeff, a bare-bones place with three farm tables where the soundtrack is the sizzle on the grill. One by one, the beefy guy from behind the counter brought burgers ($13.75) between over-toasted English muffins and heaping plates of fries (Idaho, sweet or mixed, $5).
The men ate, saying nothing about the burgers. Then Mr. Weiss passed around the ranking sheets, and each studied his personalized list to figure out where Zaitzeff fit.
For Adam Beckerman, it was No. 28. Jed Weiss and Jason Beckerman both put it at 19. Others ranked it at 25, 22, 23, 24 — an unusual consensus: the lower-middle of the pack.
“The burger did not stay together,” said Jason Beckerman, his head hung in shame at having picked Zaitzeff without visiting first, a risky proposition.
“The bacon was good but the meat had no flavor,” declared Brett Weiss.
Jed Weiss summed up: “Salt and pepper.”
They agreed they would not return to Zaitzeff, not even if they were in the neighborhood (City Hall is maybe 10 blocks away). And there are too many burgers out there waiting to be tried.
The New York Times
오늘 뉴욕시민들에게 새로운 선물이 도착했다.
웨스트 사이드에 버려진 지상 철로가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으로 모습을 바꾼 것이다.
High Line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이 지상공원의 공식적인 오픈 행사는 월요일인 어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테이프 커팅 아래 이루어졌고, 화요일인 오늘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삭막한 도심에 숨통을 틔웠다.

공원으로 개선된 구간은 로어 맨하튼의 Gansevoort Street 부터 북쪽으로 20th Street 까지이며,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6th Street에는 엘리베이터도 마련되어 있다.
개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근처 직장인들에게는 멋진 런치타임 공간이 생긴 셈이다.

1847년, 화물 운송의 필요성에 따라 웨스트 사이드 지역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열차괘도를 설치하지만, 죽음의 거리 Death Avenue 라는
오명이 생길 정도로 마차나 일반차량들과의 충돌사고가 많아 1829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교각을 세운 다음 지상에 철로를 놓는
High Line 건설 공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1934년, 개통된 지상철로는
화물열차를 통해 우유와 고기 등 1차 가공식품들을 도심으로 실어나
르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된다. 하지만 1980년, 칠면조 고기의 운송을
마지막으로 지상열차는 그 마지막 운명을 다한다.
(사진은 당시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위해 고용된 카우보이의 모습이다.)
이후, 줄리아니 시장 시절부터 지상철로의 폐기 및 재건 계획안들이 추진되었지만, 이 지역을 공공적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 아래 설립된 Friends of the High Line 이라는 단체가 뉴욕시를 상대로 오랜
협상과 설득을 거듭해 오늘의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아이디어를 처음 계획하고 단체를 설립한
작가 Joshua David와 화가 Robert Hammond가 있다. 이들이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1999년이라니까
횟수로 만 10년만에 시민의 힘으로 기적을 일구어 낸 셈이다. 이 결과를 두고 뉴욕시의 대변인은 '인내의 기적'
이라고 표현했고, 맨하튼 구청장은 위대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A great West Side story 라고 응축해서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를 상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듯 하다.
단지, 시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위원회와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차례에서
많게는 수십차례의 미팅을 각 단체별로 가져야만 한다. 또한 소요 경비에 대한 재정마련 방안까지 논의가 되기때문에
대부분 이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유명한 대지미술가 Land Artist 인 Christo와 Jeanne-Claude의 뉴욕 프로젝트 The Gates는 뉴욕시를
상대로 1975년에 처음 제안되었지만 지난 2005년 겨울에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치룰 수 있었다. 지난 26년 동안의
시간이 뉴욕시와 시민들을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지상공원의 개발 계획은 오늘 개장한 20th Street까지의 1단계 지역을 포함해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2단계는 21st Street부터 30th Street까지의 지상철로 구간을 2010년 가을 완공 목표로 개발되며, 동서를 가로지르는
긴 곡선 구간인 최종 3단계는 31st Street에서부터 34th Street 지역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1단계까지의 High Line 프로젝트에 들어간 총 비용은 1억2천5백만 달러이며, 이와 별도로 지상공원 건립을 위해
Friends of the High Line 단체에서 모금한 모금액이 4천4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비용의 일부는 녹지조성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약 100여 종류의 나무와 풀들이 심어졌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폐기된 철로 주변에서 마구 자라온 야생풀들을 제거하지 않고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공존하도록
새로운 식물들을 심었다고 하니, 무조건 뒤엎고 보는 마구잡이식 개발이 만연한 시대에 느끼는 바가 크다.

몇 달 전,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경인운하가 들어선다는 공사현장을 지나친 적이 있었다.
제법 공사가 진행되었던지 집 한채는 거뜬히 들어갈 깊이의 공간이 꽤 긴 구간에 걸쳐 이어졌는데, 비록 공사
이전의 지형모습을 본적은 없지만 한 눈에도 봐도 길이 안될만한 곳에 길을 내는 것 같은 억지스러움이 묻어났다.
더우기 몇 백미터 앞에는 이른 아침 강안개 속을 철새들이 평화로이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아마 며칠 지나지않아
갈대 숲도, 철새 둥지도, 소중히 부화해 온 알도 모두 차가운 중장비의 굉음 아래 사라졌을 것이다.
독초를 먹어가며 약초를 알아가는 명의처럼 과거의 시행착오는 반복적인 실수를 않도록 한다.
그러기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발전적인 모습을 지녀야 한다.
수치적 나열만 내세우는 개발 논리 앞에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


Renovated High Line Now Open for Strolling
June 8, 2009
By ROBIN POGREBIN
renovated stretch of an elevated promenade that was once a railway line for delivering cattle — surrounded by advocates, elected officials and architects who made the transformation happen — Mayor Michael R. Bloomberg cut a red ribbon on Monday morning to signify that the first phase of the High Line is finished and ready for strolling.
Calling the High Line, which opens to the public on Tuesday, “an extraordinary gift to our city’s future,” Mr. Bloomberg said, “Today we’re about to unwrap that gift.” He added, “It really does live up to its highest expectations.”
The first portion of the three-section High Line, which runs near the Hudson River from Gansevoort Street to West 20th Street, will be open daily from 7 a.m. to 10 p.m. There are entrances at Gansevoort Street (stairs) and at 16th Street (elevator); exits are located every few blocks.
The second phase, which extends to 30th Street, is under construction and expected to be completed by fall 2010. The third phase, up to 34th Street, has yet to be approved.
The High Line project is something of a New York fairy tale, given that it started with a couple of guys who met at a community board meeting in 1999 — Joshua David, a writer, and Robert Hammond, a painter — and discovered they shared a fervent interest in saving the abandoned railroad trestle, which had been out of commission since 1980 and was slated for demolition during the Giuliani administration. That began a decade-long endeavor that involved rescuing the structure and enlisting the Bloomberg administration in its preservation and renovation.
Scott M. Stringer, the Manhattan borough president, called the project “a great West Side story.”
The City Council speaker, Christine C. Quinn, described it as “a miracle of perseverance,” and said, “The idea could easily have gone into a file, ‘great ideas that will never happen.’ ”
With all the bureaucratic hurdles that the project had to overcome, it was fitting that so many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arms of local government were there for Monday’s celebratory news conference, including Amanda M. Burden, the city planning commissioner; Adrian Benepe, the parks commissioner; Representative Jerrold Nadler, Democrat of New York; and Seth W. Pinsky, the president of the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Also present were two couples who have been the project’s major benefactors — Diane von Furstenberg, the fashion designer, and her husband, the media mogul Barry Diller, and Philip Falcone, a hedge fund billionaire, and his wife, Lisa Maria Falcone.
The walkway, designed by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and Diller Scofidio & Renfro, includes more than 100 species of plants that were inspired by the wild seeded landscape left after the trains stopped running, Mr. Bloomberg said. He added that the High Line has helped to further something of a renaissance in the neighborhood; more than 30 new projects are planned or under construction nearby.
One of those projects includes a new satellite for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designed by Renzo Piano, which will anchor the base of the High Line at Gansevoort. The mayor announced on Monday that the city was finalizing a land sale contract with the museum.
The first two sections of the High Line cost $152 million, Mr. Bloomberg said, $44 million of which was raised by Friends of the High Line, the group that led the project.
All of the speakers’ comments echoed the triumphal subject line of an e-mail message sent out by Friends of the High Line right after the festivities had concluded: “We did it.”
The New York Times

위에 보이는 사진이 뉴욕타임즈 지역섹션에 기사와 함께 실렸다.
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동일인으로 70년이 넘는 세월의 공간이 두 사진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함께 놀던 침팬지는 뉴욕 자연사박물관에 박재되어 현재의 모습을 하고있다.
누구나 위의 사진을 보면 분명 아름다운 추억에 관한 이야기일거라 상상하겠지만 기사의 내용은 다르다.
배치에 따라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몽따쥬 이론이 유효한 이야기이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헨리 레이븐 Harry Raven 으로, 어릴적 함께 놀던 침팬지 메시 Meshie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박재되어 있는 뉴욕 자연사박물관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메시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가 메시를 처음 만난 것은 뉴욕 자연사박물관의 큐레이터로 일하던 그의 아버지가 르완다에서 사냥꾼의 손에 잡힌
어린 침팬지 한 마리를 집에 데려 오면서부터인데, 이 침팬지의 이름을 메시라고 짓고 헨리를 포함한 세 명의 아이들
과 함께 자라게 된다. 어린 메시도, 아이들도 한 동안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어느 날 메시가 어린 헨리의 손가락
을 물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메시에게 오렌지를 뺏기지 않으려다 발생한 이 사고에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오렌지를 주지않은 헨리를 꾸짖는다.
문제는 메시보다는 헨리의 아버지 Henry Cushier Raven 에게 있었다.
여느 아버지처럼 따뜻한 포옹도 뽀뽀도 없던 엄격한 아버지가 아들의 성장과정에 많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일과 관련해 오랜 동안 해외에 머무는 일이 많았던 헨리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넷째를 가졌을 때도 탐험을 위해
가족들을 떠났으며, 메시가 헨리의 손가락을 물었을 때도 헨리에게 가죽끈으로 체벌을 가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성장과 더불어 점점 난폭해지는 메시의 성향이 헨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더불어 그에게 왔어야할
따뜻한 아버지의 관심이 오히려 메시에게 돌아갔으니 그에게 메시는 그다지 행복한 기억의 대상이 아닐 수 밖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지않기 위해 82살인 지금도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헨리의 기억 속의 메시 또한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개체간의 이질성, 난폭해지는 성향을 막기위한 철창 속 생활 그리고,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결국 1934년, 메시는 시카고의 한 동물원에 보내지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37년 출산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 이후 메시는 박재가 되어 다시 뉴욕 자연사박물관에 쓸쓸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사진들은 헨리의 아버지가 직접 촬영한 어린 메시와 아이들이 함께 노는 오래 전 필름의 한 장면들이다.

Reunion With a Childhood Bully, Taxidermied
June 5, 2009
By JOYCE WADLER
You never forget the rival who cast a shadow over your childhood, monopolizing your father’s love and attention, clearly preferred. This is especially true if she has bitten your hand so deeply that nearly 80 years later, a scar is still there.
Hers is a face you remember, and so it is that Harry Raven, now 82, easily spots his old bête noire, Meshie — in a glass case at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in Manhattan, even if her only identification is a sign that says “Chimpanzee troglodytes.” “There she is, that’s her,” Mr. Raven says, walking as quickly as a guy with an arthritic hip can toward a thoughtful looking, taxidermied chimp, sitting with its legs crossed, its handlike feet, large and leathery.
How does Mr. Raven know it’s her?
“How do I know you’re you?” Mr. Raven says. “I recognize the details.”
He studies Meshie, recalling a previous exhibit that included a picture of her playing with his older sister, Jane; he imitates, with a bit of an edge, Meshie’s demanding, grunting, Uuuh-wooo! uh-awooo! yelp. Mr. Raven has said that his father’s devotion to Meshie at the expense of his family caused great heartache. But standing beside the chimp, whom he has seen now and then at the museum over the years, he shows none of the emotion one might expect at the sight of an enemy vanquished.
“I’ve mellowed,” he says.
The news stirs up memories. When a pet chimp attacked a Connecticut woman early this year, tearing off much of her face and leaving her blind, Mr. Raven, who had never spoken to reporters of his life with a chimp so famous that she got an obituary, was compelled to write to a reporter. His wife’s poor health prevented him from coming in from his home in Brick, N.J., until this week, when he arrived at The Times accompanied by his son in law, Andrew Haas, and his 10-year-old grandson, George.
Mr. Raven’s father, Henry Cushier Raven, a curator at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was a famous man whose life made headlines. “Expedition to Hunt Gorillas In Africa” read one, in this newspaper, when he set sail in May 1929.
Two years later, when Mr. Raven returned with an orphaned female chimp named Meshie and seemingly made it a member of his household in Baldwin on Long Island, that made news, too. He took photographs and home movies of Meshie as she snuggled between the Raven children in bed; having a tea party with them; even holding Mary, the youngest, when she was a few months old. A Christmas card showed Meshie, in boots, hauling Jane and Harry on a sled through the snow. Sometimes Henry Raven took Meshie to work at the museum, where she had lunch with him. Magazine stories of the time reported that the children considered Meshie a sibling.
All of this still drives Harry Raven, a polite, mild-mannered man, a little crazy. Meshie was never considered a sibling, he says. She was cute and nonthreatening when his father first brought her home — he has a memory of her dozing in an apple crate in the basement — but as soon as she grew up she was strong and unpredictable. She never slept in a bed — she was kept in a cage in the basement or backyard. The only time she played with him and his sister was when his father was shooting movies. When something went wrong — like the time Meshie bit Harry on the finger because he didn’t give her an orange quickly enough — the scene was cut.
His father he remembers as a harsh, domineering man, who punished his son with a razor strop, left his family for long periods to go exploring, and was affectionate only with the chimp.
“I can’t think of him ever giving anybody a hug, except Meshie,” Mr. Raven said this week during a visit to The New York Times with his son in law and grandson before visiting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I used to go down the street and wait for him to get off the commuter bus. I would run down to give him a hug, he would lean down and I would kiss him on the cheek, but he would never kiss me.”
As the chimp became older, she escaped more often, Mr. Raven recalls. When his mother was pregnant with her fourth child and his father announced he was going to leave on yet another expedition, his mother burst into tears and said she could no longer take it.
In 1934, Meshie was shipped to the Brookfield Zoo in Chicago. After she died in 1937, after giving birth, Henry Raven had her sent back to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and preserved. He died seven years later, at age 54. The Meshie story, as far as Harry Raven was concerned, was over. He kept no pictures of her in the house, although he does say that after he married and was living in Chicago he went to see Mike, the chimpanzee who impregnated Meshie.
Why did he do that?
“Just curious.”
It’s time to visit the museum. Meshie means nothing to him — it’s just another museum exhibit, Mr. Raven says. Still the museum entrance, with the dinosaur bones of Barosaurus defending her young, sets him remembering: His father’s office in one of the great round towers; a story about the way his father, facing a charging gorilla, told the African bearers to hold their spears, in order not to damage the hide; the way, as a father of two daughters, he tried not to be his father.
The New York Times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다.
흔히 접하는 잡지나 신문을 보다보면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는 광고들을 보게 되는데,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만큼 멋진 비주얼의 모델들이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곤 한다.
과연 그 이미지가 전달하는 내용은 진실일까?
상품 광고의 경우 객관적인 진실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과장광고 또는 허위광고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보여지는 객관적 데이타에 적용될 뿐, 상품 홍보를 위한 모델 이미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형식의 규제가
전무한 형편이다.

위의 사진처럼 실제 촬영한 모델의 몸매에 변형을 준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누구나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것이고 이를 무의식적으로 상품의 이미지와 연관짓게 될것이다.
화장품 광고 역시 실제 촬영된 모델 피부의 잡티를 싹 걷어내고 새로운 피부를 창조해낸다면
그 과정을 알 수없는 소비자로서는 그것을 화장품의 효능으로 받아들 일 수 밖에 없다.
실제 한국의 유명 탤런트를 모델로 써서 촬영한 많은 패션 상품들이 그 편집과정에서 포토샵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리를 늘리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조작해 상품의 장점을 더욱 눈에 띄도록 이미지 조작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있다. 이런 경우, 광고 페이지 안에 컴퓨터를 통해 리터칭되었음을 표기하는 것이 옳을까?
아래 주소의 뉴욕타임즈 동영상을 통해 이에 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http://video.nytimes.com/video/2009/03/09/opinion/1194838469575/sex-lies-and-photoshop.html
Sex, Lies and Photoshop
Why magazines should let readers know if images have been retouched.
Published on March 30th, 2009
With so much falsehood in fashion advertising, just how much are we affecting the minds of the younger generation? Magazines, billboards and other print media push an unattainable fantasy world upon us. So when laws are being considered to have publications clearly label ‘Photoshopped’ images, personally, I’m all for that.
French public health officials want to combat eating disorders by having magazines say to what extent their photos have been retouched.
The New York Times has featured a short video (less than 5 minutes long) explaining why magazines should be more transparent (video produced by Jesse Epstein of Wet Dreams and False Images).

바오밥 나무라고 하니 제일 먼저 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가 생각난다.
그 외에 아프리카 초원에서 자라는 이상하게 생긴 나무?! 더 이상 생각하려 해도 이게 전부인 듯 한데,
오늘 자 뉴욕 타임즈 오피니언 섹션에 난 기사를 보니 내가 모르던 바오밥 나무에 관련한 상식들이 참 많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오밥 나무가 신령한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고 한다.
우선, 바오밥 나무는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며, 사람들에게는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들을 줌과 동시에 가축들의 먹이를 제공하고 피신처 및 음식 그리고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하기에 일종의 수호신
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듯 하다.
실제로 저자는 바오밥 나무가 말라리아와, 불임, 천식 등의 치료제 또는 진통제로 쓰이는 것을 보아왔고, 새로운
수퍼 푸드로서의 바오밥 나무의 미래적인 전망을 얘기하고 있다. 바오밥 나무 열매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있으며 칼륨, 인, 오렌지의 6배에 달하는 비타민 C 그리고 우유의 두 배에 달하는 칼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잎에는 철분, 칼륨,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인 성분을 그리고 뿌리 역시 풍부한 단백질을 지니고 있다니
말 그대로 영양의 보고인 셈이다.
이미 식품으로의 판매를 위한 유럽 식양청 승인이 진행중이며, 영국에서는 바오밥 나무 성분으로 만든 잼이 병당
11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한 관련 기관은 바오밥 나무 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약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아프리카에서만 2백만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본다니 아프리카 사람들의 신앙적인 믿음이
딱 들어맞는 듯하다.
하지만 밝은 이면에는 선결되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량 재배가 되어야 하는데 바오밥 나무는 야생에서만 자란다고 한다.
이 문제야 고등어 양식처럼 꾸준히 연구하다보면 근 시일내에 대량 재배가 가능할 거라 보여지는데, 다른 또 하나의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이면서 도덕적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첫 단추부터 짤 꿰어야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대안무역' 혹은 '공정무역'이라 부르는, 제 3세계 생산자를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무역운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비 양심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여전히
많은 수의 제 3세계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금전적 댓가를 받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는 그대로 교육이나 의료적 문제로 연결되어 그들의 미래마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영혼마저도 옭아
매고 있다.
만약, 바오밥 나무가 산업의 새로운 광맥으로 부상을 하게되면 과연 이들 빈곤국들이 선진국들과의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까? 커피 산업과 같이 이윤이 적은 1차 산업 영역만 담당한채 가공단계 혹은 최종단계의 상품화 산업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현실성있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 3세계의 이런 1차 산업 발달이 실제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특수층의 배를 불리며 심지어 내전이나 전쟁으로 애꿎은 인명마저 앗아가는 역사적인 폐해를 수십차례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기우로만 여겨지지는 않는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오밥 나무를 통한 식품 산업이 시작된다면, 나날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가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이와 관련한 상품들이 한번 쯤은 광풍처럼 우리 식탁을 휩쓸 것 같다. 중요한 점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거래와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익히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들도 이겨내도록 돕는게 앞서가는 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이 기사는 어린왕자에 나오는 문구로 재치있게 그 상징적인 말미를 대신한다.
Taking care of your planet, he says, “is very tedious work, but very easy.”
What Will Happen When the Baobab Goes Global?
May 25, 2009
By DAWN STARIN
IT’s known as the baobab in English, sito in Mandinka, gwi in Wolof and Adansonia digitata in botanical circles. Sometimes it’s called the upside-down tree, because its weirdly shaped branches resemble roots. It was made famous in the West by Antoine de Saint-Exupéry’s fable “The Little Prince.”

While living in Gambia I saw parts of the baobab used to treat everything from malarial fever, infertility and asthma to headaches and toothaches. I have no idea if and how these local remedies worked, but all of a sudden the rest of the world — Western health food companies included — is catching on. There’s a growing belief that the baobab may be the world’s newest super food.
The tree’s white, powdery fruit is rich in antioxidants, potassium and phosphorus, and has six times as much vitamin C as oranges and twice as much calcium as milk. The leaves are an excellent source of iron, potassium, magnesium, manganese, molybdenum and phosphorus, and the seeds are packed with protein.
The baobab was approved for European markets last year, and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follow suit soon. The fruit’s dry pulp will be sold as an ingredient in smoothies and cereal bars. Already, a small jar of African baobab jam made in England sells for around $11. According to the Natural Resources Institute in Britain, an international baobab industry could bring in about $1 billion a year and provide jobs for 2.5 million African families. On paper this sounds great, but there’s another side to the picture.
The baobab has never been a plantation tree; it grows wild in arid regions. (It can also be found in Australia, but it thrives in few other places outside Africa.) Presently people harvest only what they need and maybe a bit more to sell at local markets. If it becomes an international commodity, the baobab probably would need to be planted as a crop, even though arable soil is limited. The open land where local people now freely harvest wild baobab could be developed by agribusinesses into plantations, or else precious forests or farmland used to grow everyday staple crops could be turned over to the baobab export industry.
Although local people would probably find jobs on such farms, their ability to harvest or purchase the baobab themselves would be limited. They wouldn’t be able to pay as much as London dealers could. This means that some Africans could lose a source of household wealth, an important part of their diet and an essential pharmaceutical resource.
These possibilities — not to mention the threat of corruption, poor wages and genetic modification leading to a loss of the tree’s biodiversity — are not random predictions. Africa is no stranger to the overexploitation of its natural resources. But the solution isn’t necessarily to cut the baobab off from international markets. Regulations could be put in place to protect the tree, its environment and the people who depend on it — and still allow for profitable production.
The coffee trade provides a model. It’s clear that many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more for fairly traded coffee — which costs enough to provide the growers a decent wage for their labor. This bottom-up pricing should be applied to the baobab market, even if it means European health nuts have to pay a lot for their smoothies.
The baobab’s new popularity is exciting, but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African exporters should decide on regulations before the baobab is rushed to European and North American markets.
In Saint-Exupéry’s story, the planet the Little Prince lives on is too small to support the baobab. This is hardly our situation, but the Little Prince still has some useful advice for us: Taking care of your planet, he says, “is very tedious work, but very easy.”
Dawn Starin is an anthropologist.
The New York Times
동성결혼이 뉴욕주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거라는 보고가 나왔다.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적어도 3년 간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약 2억1천만 달러(한화 2천6백억
원)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인데, 비록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6천9백만 달러 정도의 주 정부 보조금이
지출된다고 하지만, 동성결혼을 통한 결혼식 비용, 결혼 관련 산업들의 매출증대, 동성커플로 인한 납세금까지 감안
한다면 지금같은 경제불황기에 2억 달러는 수치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적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하겠다.
문제는 동성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찬성과 반대가 워낙 팽팽한데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인권과 종교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이 참 여려운 문제다. 다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인류의
문화적인 영역에서 도덕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는 있되 그것을 법문화시켜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옳지 않다고 생각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곳은 워싱턴 DC를 포함해 코네티컷, 아이오와, 메사추세츠, 버몬트 그리고
메인 이렇게 여섯 곳이다. 이 중 워싱턴 DC는 특별지구(District of Columbia )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허용한
주(州)는 총 다섯 곳이 되는데,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주대법원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한 주민발의안을 통해 불과 몇 개월만에 판결을 뒤집어 1만6천 커플의 결혼허가서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뉴욕의 경우 David A. Paterson 주지사의 발의로 허용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추가글>
오늘 자 신문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부터 주민발의안이 인정된 기간 사이에 결혼인정서를
받은 1만6천명의 동성커플에 한해 정식으로 법적혼인 사실을 승인한다고 보도했다. (05/27/2009)
Would Gay Marriage Help the State Economy?
May 26, 2009, 11:45 am
By Jeremy W. Peters
But, at the same time, the analysis also determined that the cost to businesses of providing benefits like health insurance to married same-sex couples would be about $69 million over three years, with about $37 million of that paid by businesses in New York City.
The report estimated no additional cost to the state or the city because both already provide benefits to domestic partners of their employees. In addition, the state already recognizes same-sex marriages from other states where they are legal like Massachusetts and Connecticut.
“New York State and New York City stand to benefit economically if marriage equality is passed in our state,” the city comptroller, William C. Thompson Jr., said Tuesday in a statement accompanying his report. “Legalizing marriage for same-sex couples is not only good for the couples, but also for our economy.”
Same-sex marriage legislation is currently making its way through Albany. The State Assembly has already passed the bill, which would broaden the state’s definition of marriage to include gay and lesbian couples. But the legislation’s fate in the State Senate is in doubt.
Gay rights advocates concede that they do not have enough support in the 62-member Senate to push the bill through. With less than a month left before the State Legislature adjourns for the year, it is unclear whether supporters will be able to round up enough votes.
Advocates and lobbyists on both sides of the issue have set their sights on a group of about a dozen senators whom they believe have not definitively reached a decision on the bill. No vote has been scheduled yet in the Senate.
Mr. Thompson’s assessment, which took into account the impact of the recession and moves by other nearby states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recently, factors in the kinds of expenses that couples and their guests usually have for weddings — from hotel stays to banquet hall rentals to gift purchases.
The report acknowledges that if the economic downturn forces people to tighten their spending on weddings, the economic impact for the state would fall to $178 million from $210 million.
The New York Times
뉴욕 지하철 요금이 5월 31일부터 인상된다.
어제 지하철 공사의 요금인상과 운행서비스제한에 대한 표결이 찬성12표, 반대 1표로 겂도 없이 통과되었다.
이제 두달 후면, 싱글라이드 요금이 현행 $2에서 $2.50으로 $0.50 인상되며
일주일 정액권은 $25에서 $31로 $6이, 한달 정액권은 $81에서 $103으로 무려 $22이 오르게 된다.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뉴욕의 지하철은 100년의 역사라는 것을 빼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차라리 그런 역사 따위는 박물관에 기증하고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싶은 것이 모든 뉴요커들의 심정일 것이다.
지하철 티켓이 무슨 동물원 입장권도 아니고 항시 역사에는 고양이만한 쥐가 돌아다니고,
밤사이 홈리스들이 내지른 소변 냄새를 비롯한 악취가 계단과 열차 내에 진동을 하며,
툭하면 해당 역에 정차를 하지않아 몇 블럭을 걸어 다른 역으로 걸어야하는 일도 다반사다.
한번은 빈자리에 앉았다가 그곳에 얌전히 고여있는 소변에 엉덩이 부분이 크게 젖기까지 했다.
뭐,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것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 사치스런 요구이고..
이 정도 되면 비용을 투자해서 낙후된 부분들을 보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유니온의 임금인상 요구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모양으로 돈을 빨아먹는 시설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작 요금을 인상하고도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운행서비스에도 제한을 두게 되었는데, 적잖은 역사의 티켓부스가 제한적으로
오픈을 하고, 시간별로 운행 열차량을 줄이며, 일부 버스 노선 역시 폐지 혹은 단축 운행을 한다고 한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가슴을 폭폭하게 만드는 뉴스다.
MTA Votes to Raise Transit Fares and Cut Service
Wednesday March 25, 2009
Today,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voted 12 to 1 to pass their "doomsday plan" to raise
transit fares to $2.50 and implement widespread service cuts as of May 31, 2009.
The goal of the plan is to balance an MTA budget deficit of approximately $1.2 billion. The MTA is required
by law to pass a balanced budget. Board member Norman Seabrook was the only voter to oppose the fare
hikes and service cuts.
For weeks, New Yorkers have held onto hope that Albany would pass measures to bail out the MTA and
make the doomsday plan unnecessary, but state lawmakers we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regarding
an alternative solution. Experts believe that Albany may yet come to the rescue before the changes take
effect on May 31st.
Mayor Bloomberg has been very vocal about his position on the issue. In a statement today, he said,
"I do think it’s the responsibility of Albany to come up with a plan.”
Here's how the fare hikes will impact your commuting budget as of May 31, 2009:
The price for a single ride will jump from $2 to $2.50
The cost of a 7-day MetroCard pass will increase from $25 to $31
The cost of a 14-day MetroCard pass will rise from $47 to $59
The cost of a 30-day MetroCard pass will jump from $81 to $103.
Service cuts will eliminate some bus and subway routes and reduce service on others.
Learn more about how service cuts will affect your commute by searching for service change information
by zip code or by train or bus line.
How do you feel about this "doomsday plan"? Is it fair to commuters? Should the state government step in?
I'm off to enjoy my $2 subway ride and silently curse the MTA and the state of New York.
Aboout.com
Pamela Skillings